
알베르 까뮈: 전락(2019). Changbi Publishers
창비에서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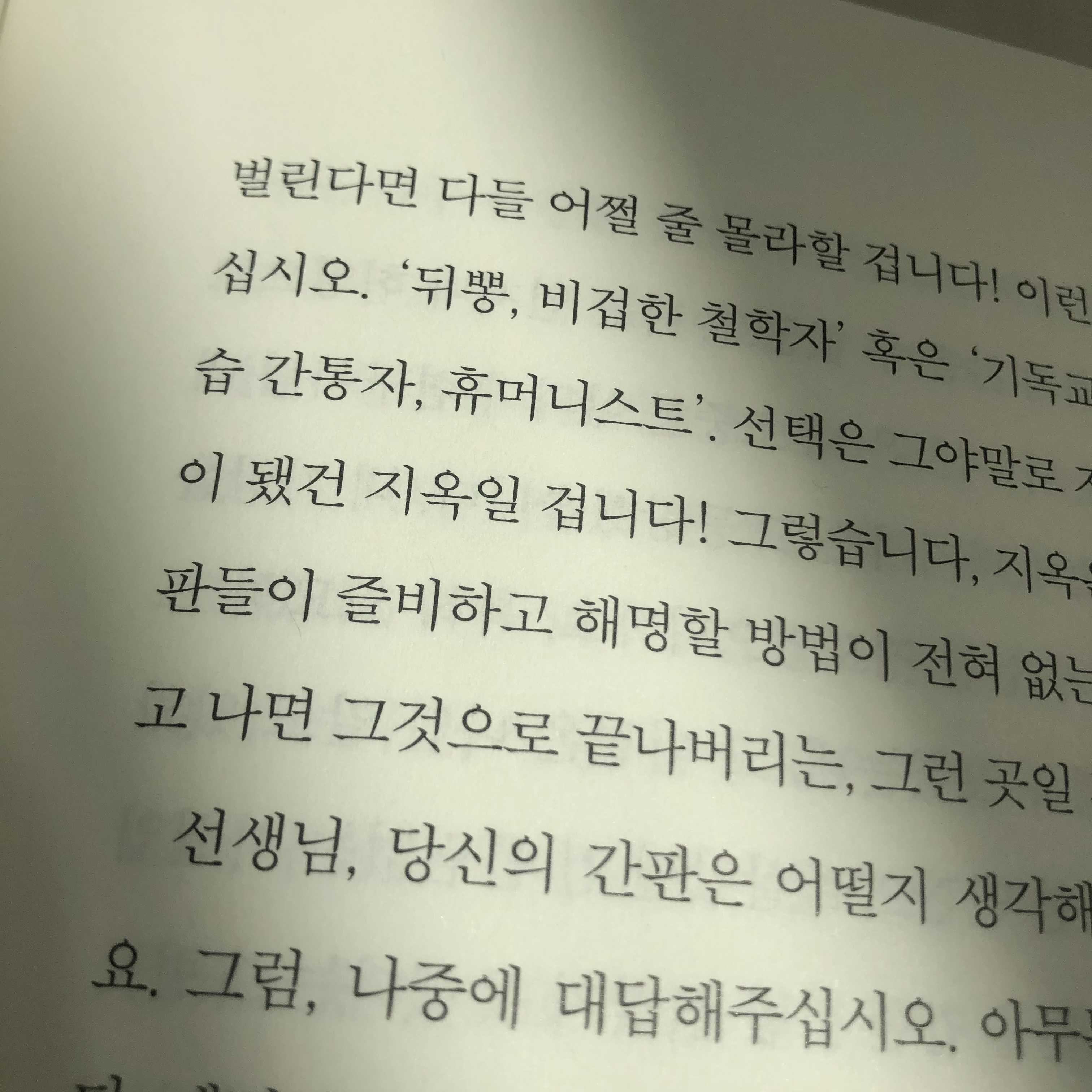
가식과 인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가 있을까. 언제나 우리의 삶이 곱게 포장되어 있어 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집어 버리는 반전에 대해 늘 꿈꿔온 것 같다. 그래서 종종 등장하곤 한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위선이 그대로 드러난 추악함을 보이게 되는 장면들. 끌라망스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변곡점이 될 사건이 찾아오게 된 날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종종걸음으로 도망을 왔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곧 그 깨달음의 시작은 몰라온, 혹은 부정해온 자신 속 끔찍한 모습과의 만남을 의미했다.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자신이 사랑함으로 인해 주변의 것들이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한 없이 오만한 생각 같다. 그러나 그것이 또 멀게만 느껴지냐 하면 또 아니라 할 수 있다. 언제나 우리의 시작은 나의 중심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느 순간 깨어지느냐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으니까. 나를 통해 돌아가는 세상이 사실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가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님을 깨닫는 과정은 잔인하다. 끌라망스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 뒤늦었기 때문일까.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너무도 깊숙한 곳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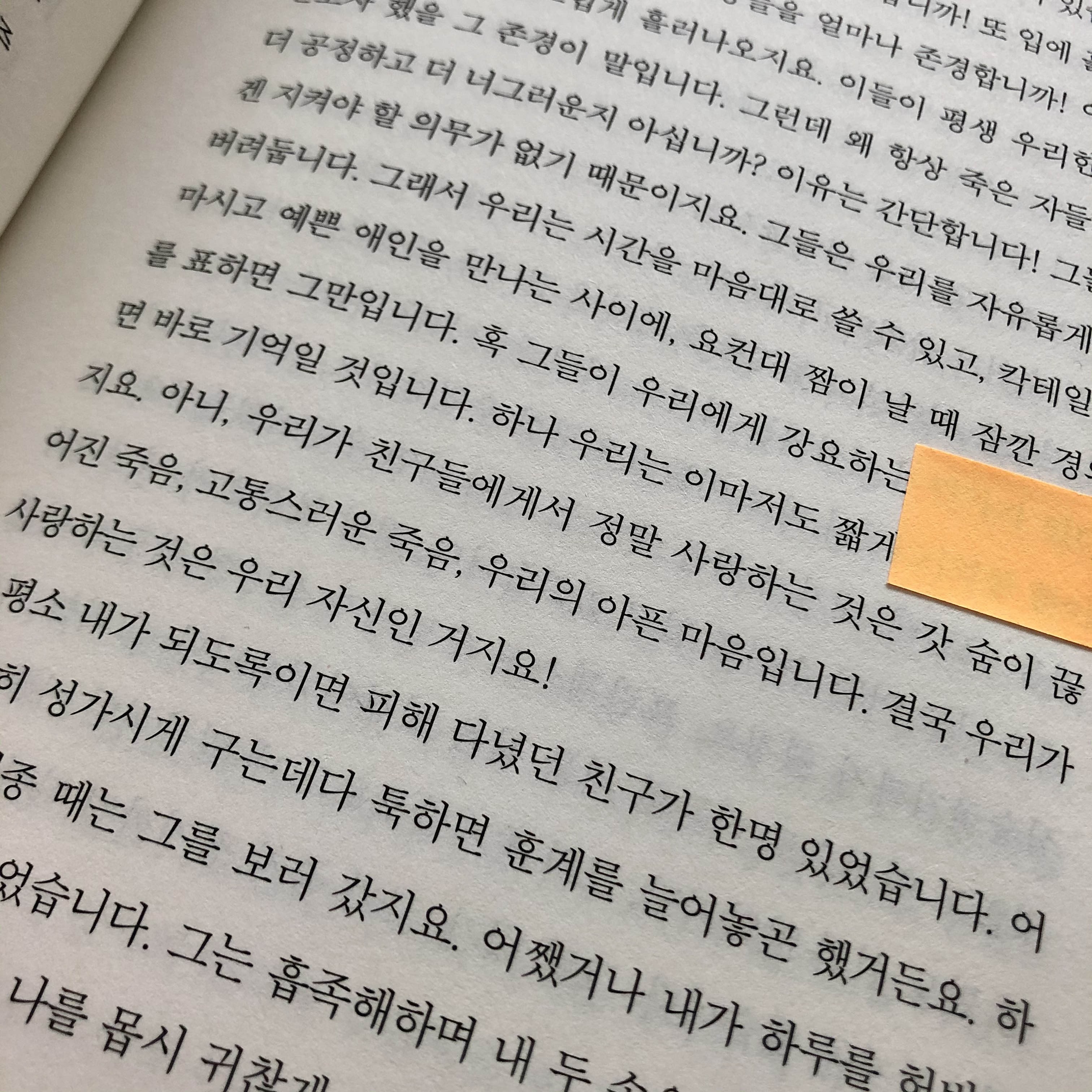
모두가 나의 기대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자 미처 알지 못했던 무서운 것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다. 여태껏 굽혀오고 펼쳐온 자신의 마음의 것들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정반대가 되어, 있는 힘껏 혐오를 쏟아내고 싶어 지는 것이다. 마치 배신당한 마음과 같다. 사실 그 속내는 한없이 군림하고 있음을 자신하고 있는 시혜적인 위치의 자랑이 가득했지만 그 아름다운 상상이 깨지고 나니 배신당한 마음만큼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다.
꼭 그렇지 않은가.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항상 언제나 해왔던 것들이 사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누군가 알지 못하더라도 늘 선의를 베푼다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수치스러운 의심이 피어나고 마는 것이다. 그 마음에는 진정 진실함을 담고 있느냐고. 이기적이고 못된 생각들이 불쑥 고개를 드미는 이유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 겪어왔기 때문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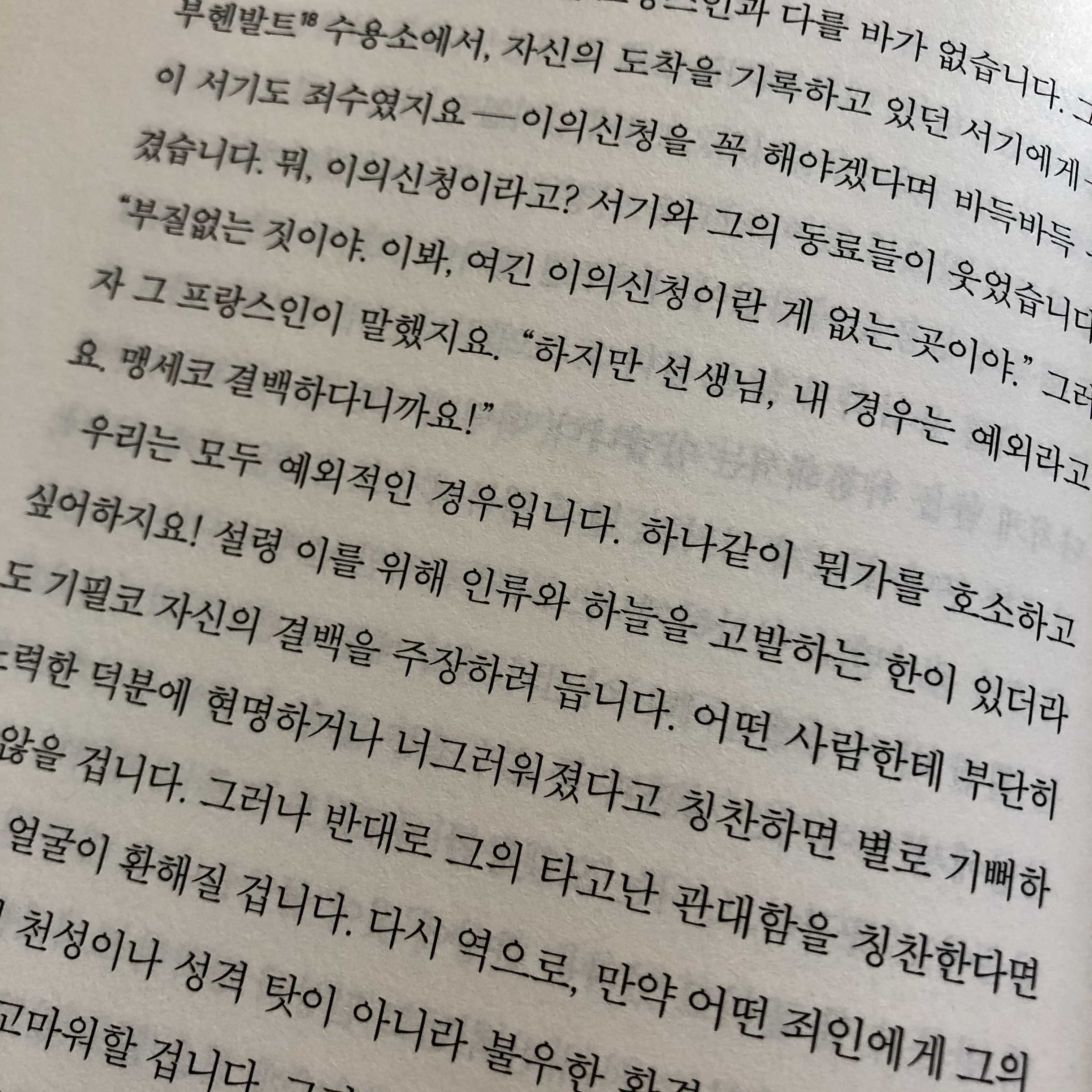
파렴치한 모습과 억누르고 싶은 충동이 넘나드는 모습이 진실이며, 그렇기에 끌라망스가 얘기해온 '나'의 죄가 곧 '우리'의 죄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위선과 가식이 없는 투명한 그곳이 과연 이상이 될 수 있을까. 전락轉落의 시작을 멈추지 못한 죄에 대한 참회라고 하기엔 살아갈 모든 존재들의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운 것이 실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허상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부딪혀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진실과 이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여기게 된다. 속죄하는 길에서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먼 지하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게 여겨져 가면을 벗어내려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끌라망스의 목소리에 마음이 거슬려 오는 것이,
자신의 죄악에서 인간의 실상을 보이려 한 그가 성공한지도 모른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의 심장 - 미하일 불가꼬프 (1) | 2020.12.14 |
|---|---|
|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 정미진 (0) | 2020.12.07 |
| 상상병 환자 - 몰리에르 (0) | 2020.11.23 |
| 두 도시 이야기 - 찰스 디킨스 (2) (0) | 2020.11.16 |
| 침묵 - 돈 드릴로 (0) | 2020.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