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1859). Changbi Publishers
* 창비에서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얄궂은 이 없었고 누구 하나 마음 편히 미워할 수 없었다. 억압과 고난을 만들어낸 이들을 향해 쏟아낸 것은 또 다른 폭력이었다. 결국 다시 만들어진 생지옥은 어쩐지 비슷한 모양새였다. 명료하게 이성을 내세울 수 없는 환경은 자연스럽게 분노를 쏟아내기 좋은 곳이었고 뒤틀린 듯 기이한 모습의 시민들은 분노에 차있었다. 두 도시를 오가며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몇 명의 인물들이 만들어낸 「두 도시 이야기」의 끝은 '두 도시 이야기, 그리고 시민'이었다. 전반부를 읽고 나서 우리에게서 낯설지 않은 모습이라 했던 게 기억이 난다. 단순히 우리에게만 비슷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집단이 사회를 이룬 이상 이것은 세계의, 모두의 이야기다.
허리엔 단검을, 허리엔 총을, 손에는 날카롭게 벼려낸 칼을 쥔 이들이 모인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기요띤을 적실 짙은 포도주, 그들의 머리, 그들의 피.
특별한 죄목이 없다고 한들 억울해하지 않는 것은, 안온하게 누려온 자신들의 세상이 끝났다는 것은 기요띤 앞에서 알아챘기 때문일까. 그럼에도 여전히 지니고 배워온 것은 퀘퀘한 치례와 격식 따위라 끔찍한 곳에서도 과거가 될 모습을 보일 뿐이다. 죄명은 무지다. 평안하게, 현실에 안주해온, 잘못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은 누려온 삶이 그들의 죄목이다. 개미만큼 쉽게 뜯어내고 쉽게 길가에 버려놓은 이들에게는 단단히 갈아온 이빨이 있고 결국 그들에게 물어뜯기는 것이 고매한 귀족의 말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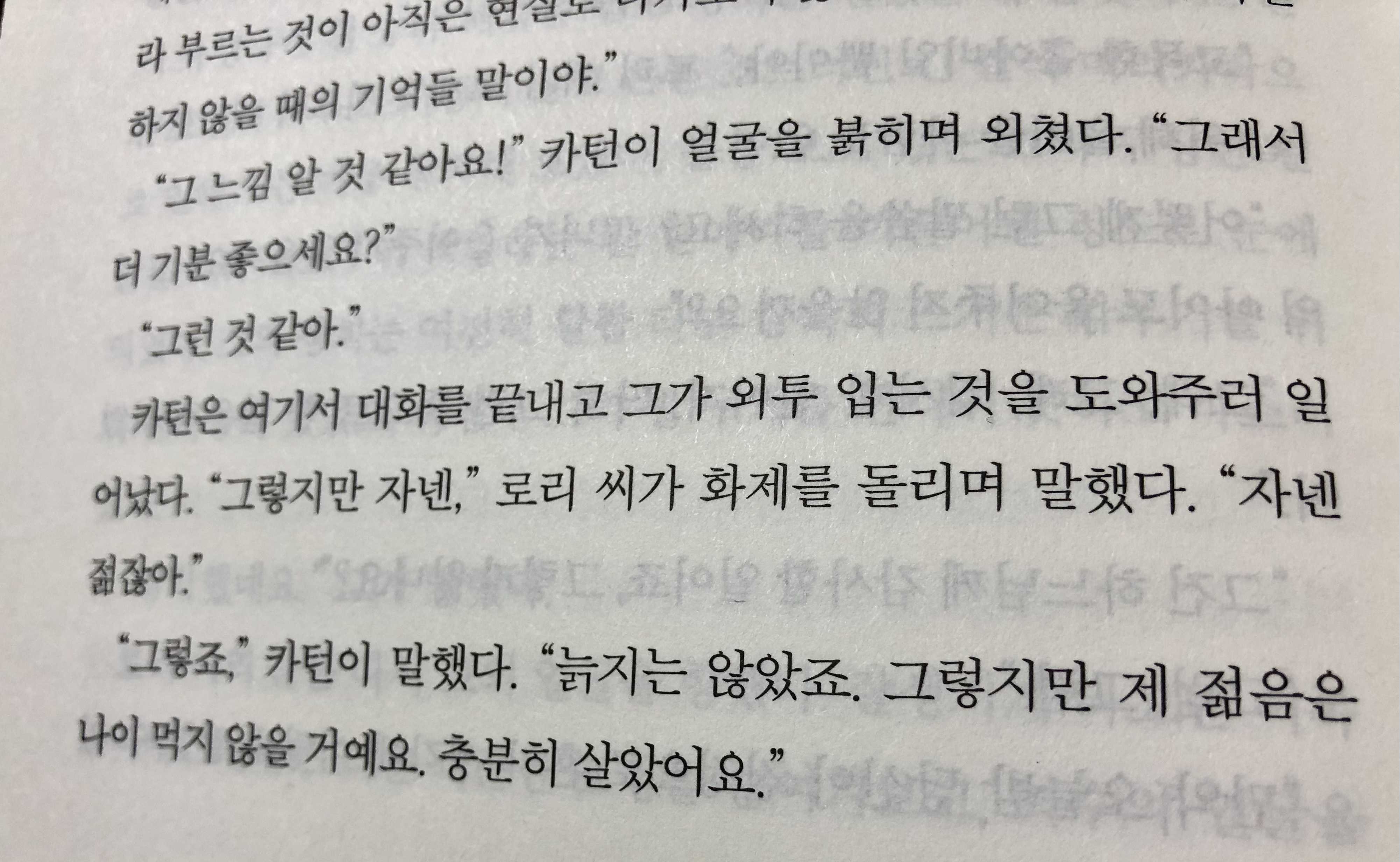
역사를 쓰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낱 작은 인간일 뿐이라. 죽음도, 삶도 모든 것이 공평했다. 쉽게 죽고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다. 마치 잃어버린 이들만이 바보가 된 것처럼. 대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온 이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시작과 끝을 맺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이 지켜낸 소중한 것들은 끝에 다다라서야 진가를 보였다. 나는 내가 한없이 이기적임을 알고, 겁쟁이임을 알고, 그렇기에 그들과 같아질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장의 내 삶에 위험이 치받고 있음에도 과연 그렇게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항상 결국 남는 것이 사랑일 뿐이라는 게 지겨워지다가도 한 가지를 알아채고 만다. 쉽게 쓰이고 쉽게 잊힐 개인의 삶이라는 것에 큰 역사가 뒤흔들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에게 있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랑일 뿐이라고. 마음을 가진 인간이 분노하고 징벌하고 정의를 찾는 만큼,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사실 초반에서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들의 사랑을 의심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되고 말리라는 것을.
애써 부인해봤지만 결국 나는 틀리고 숭고한 행동이 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결국 뻔하고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지만 그 예상이 맞아서 한편으로 안도하게 된다. 최선을 꿈꿀 수 있게 만든 것이, 희망을 가져다준 이 감정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보며 안도한다. 아직도 말만이라도 다짐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희생과 사랑의 이끎에 따라가고 싶어 진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삶에 있어 이러한 소중한 책들을 품고 가지 못하는 것에 더 아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낱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로 머리를 채우느라 고생스러워하지 않고 좋은 글, 좋은 세계를 보며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얼마나 더 가슴을 두드리는 것들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들을 만날수록 안타까워진다. 그리고 초조하다. 아직 못 만난 수많은 좋은 것들로 채워가기에 나의 시간이 부족할까 봐.
어떻게 말로 백 마디 하는 것보다 조용히 가슴속에 안겨주고 싶은 책이었다. 글쎄 이 한 권이 곧 역사이고, 사회고, 시민이고, 우리인데 더 말하는 것이 입 아플 정도다. 만난다면 손을 부여잡고 앉힌 뒤 당장이라도 읽기 시작해보라고 권유해주고 싶은데.
디킨스는 쉬이 어느 쪽에도 감화되지 않도록 양쪽에서 팽팽히 줄을 잡아당겨 꼿꼿이 서있게 만든다. 나는 그에 몸을 맡기고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기분과 가슴을 따라갈 뿐이다. 격하게 끓어오르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흘러넘치다가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쥐 죽은 듯 조용해지는 밤이 반복되듯이. 결국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다가오게 될 테니.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락 - 알베르 까뮈 (0) | 2020.11.30 |
|---|---|
| 상상병 환자 - 몰리에르 (0) | 2020.11.23 |
| 침묵 - 돈 드릴로 (0) | 2020.11.09 |
|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3 - 아르놀트 하우저 (0) | 2020.11.02 |
| 사랑이 나에게 - 안경숙 (0) | 2020.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