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록: 아무 다짐도 하지 않기로 해요(2020). Changbi Publishers
* 창비에서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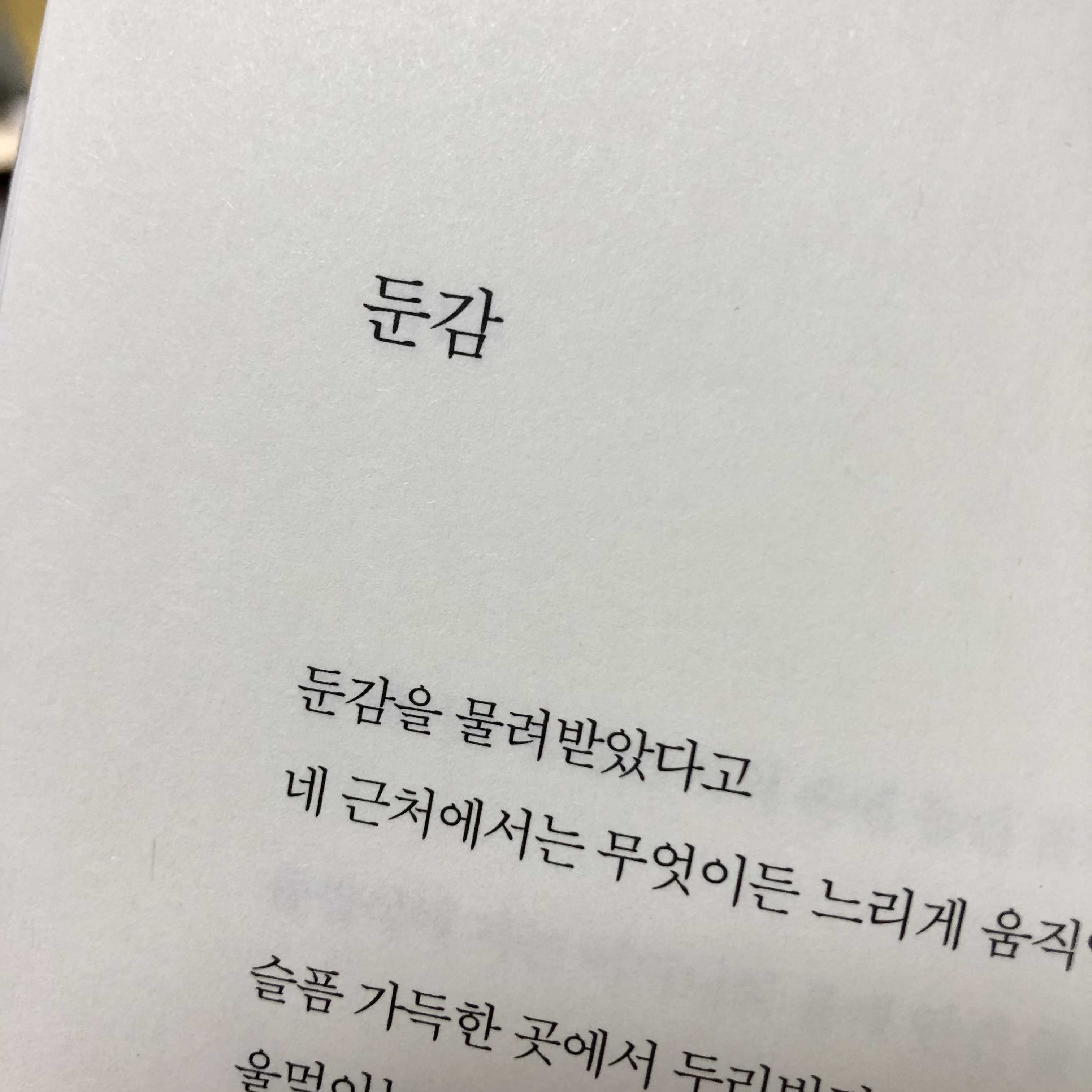
둔감과 미련. 다르지만 비슷한 것. 나는 그중 미련함을 선물 받았다. 어릴 적 나는 조숙한 애늙은이였고, 지금에 와서는 침착하고 섬세한 사람이 되었다. 뒤늦게 밀려오는 슬픔에 잠겨 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조용히 슬픔을 맞아들이길 택했다. 왁자지껄함에 있어서도, 열화가 몰아쳐도, 가만히 서서 침착을 가장했다. 그것을 원해서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저 언젠가부터 그것에 익숙해진 나의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나 역시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나 역시 울음을 토해내고 싶었다.
힘껏, 목이 아파올 때까지.
조금씩 동화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알고 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가장 깊숙한 것들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 보내는 안타까운 눈빛을. 방문을 닫고, 이불을 꼭꼭 눌러 덮고 그 안에 웅크려서야 토해내는 나의 기쁨과 슬픔과 절망의 모든 것들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다. 나도 그대들과 다르지 않은데. 함께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의 크기를 가졌다는 걸 알아주길 바랄 뿐인데. 기름처럼 동떨어져 버린 모습이 처량한 가 싶어 떨다가도 이내 괜찮다고 다독이고 만다. 그것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할과 지위는 개인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조직에서 빠져나간다고 한들, 역할과 지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그게 어쩐지 소름 돋았고 무서웠다. 별스러울 것 없는 조직을 설명하는 강의 내용이었고 그냥 그렇게 넘기면 될 일이었다. 그것을 별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이상한 것이라 생각했다. 언젠가부터 내가 별스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없이 우울을 겪었던 사춘기 시절부터였을까. 아니면 내가 자라고 있음을 인지했을 때부터였을까. 내가 졸업을 해도 학교에는 늘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고 나의 존재는 서서히 잊혔다. 새로운 사람이 익숙한 곳에 자리하게 되었을 뿐. 나는 늘 그만두고 있지만, 그 자취를 기억해주는 이는 없는 것 같아 그 사실이 나를 너무도 괴롭게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유명인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강단에 서서 스스로가 지나온 삶에 대하여 멋스럽게 강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꼭 그들처럼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항상 벌벌 떨면서도 사람들 앞에 먼저 나서는 것을 꺼리지 않고 중심이 되고자 한 것은 나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 그것이 참 마음에 든다는 말.
한평생을 다하여 일을 하고 그에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 어느덧 당신께서 끝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늘 궁금했다. 그렇게 사랑한 회사가 자신이 없어도 무리 없이 전진을 계속하고, 어느덧 당신이 없는 자리가 희미해짐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냐고. 내가 가진 지금의 공허함이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을 때. 일평생의 가장 큰 공허를 마주했을 때. 그것도 그러려니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어쩌면 별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받고자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그 질문에 말 못 할 표정을 짓게 되실까.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아무 힘도 없이 아무 위로의 말조차 건넨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이를 악물어 참아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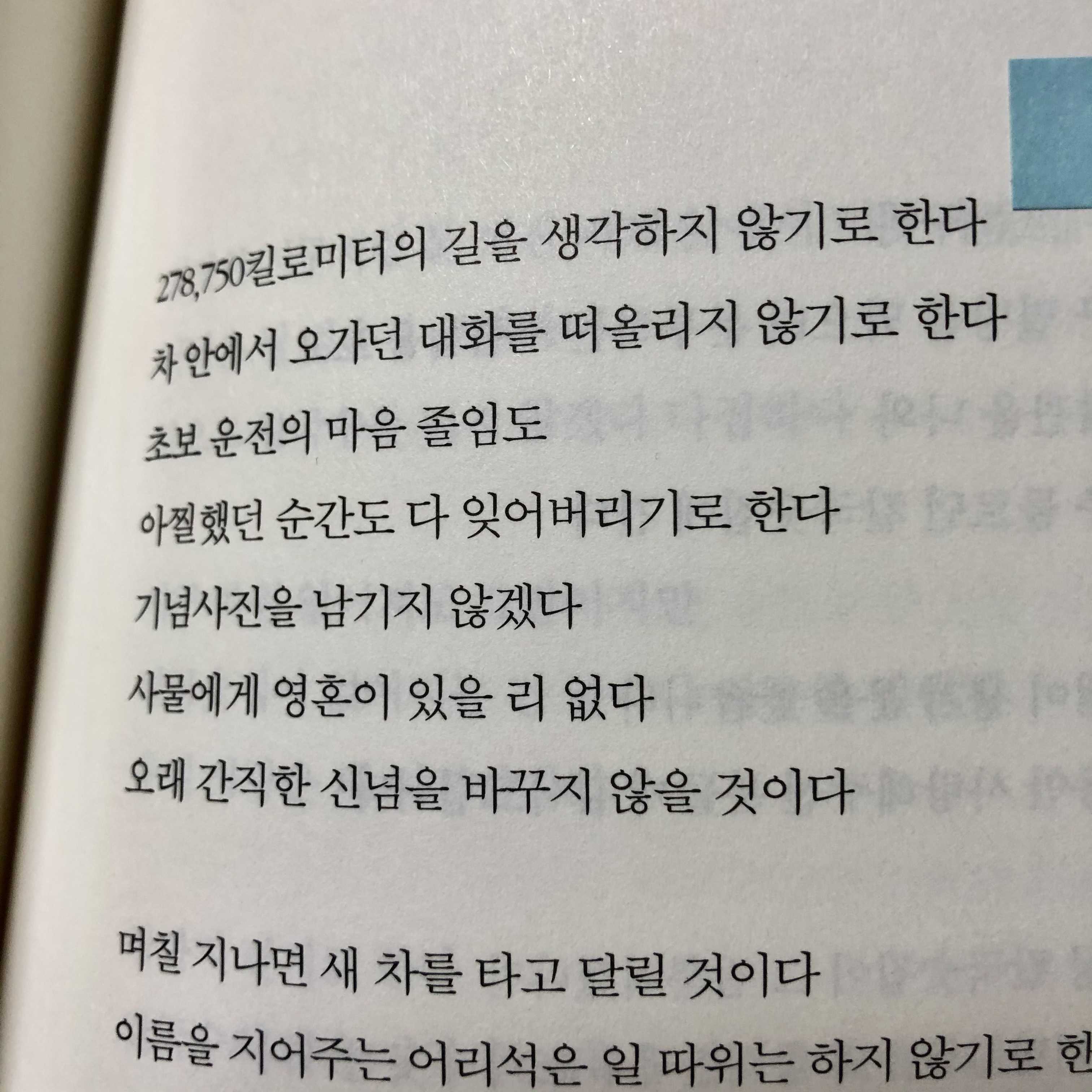
경기 2토 ____
멀지 않은 이름. 지워지지 않을 이름. 나의 어린 시절을, 우리 가족이 가장 젊었던 시절을 다한 우리 모두의 첫 차. 그것에 특별한 별칭은 없었다. 그러나 적어두는 몇 자리 숫자만으로 우리 가족에겐 가장 큰 의미가 되었다. 지금보다 더 좁은 집에 살던 시절,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에 와글와글 모여 서로의 체온에 따뜻해진 공기 속에서, 한 밤의 도로를 달렸더랬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쥐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편의점표 핫초코가 만드는 다디단 무언가가 마음에 차올랐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네 명의 우리 가족에 맞춘 듯 그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았다. 점차 연식이 다하여 힘이 부족한 것도 낑낑거리며 팔을 재게 놀려야 여닫을 수 있는 창문도 당시엔 어찌나 짜증스러웠던지. 낯선 기분을 만드는 낯선 냄새가 가득한 거대한 새 차를 마주했을 때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닫던 순간이 미안하다. 핸들이라도, 창문을 올리던 손잡이라도 떼어왔어야 하나 하고 농담을 하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가라앉은 아쉬움이 엿보였을 때 어쩐지 가시질 않는 허전함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겨졌음을 깨달았다. 가장 젊을 시절의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나날, 셋넷이 된 가족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모를 곳에 아무도 모를 형태로 바뀌어버리겠지만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것아 그 어드메를 눈으로 좇는다.
유병록 시인은 일상에 감춰온, 잊어둔 무언갈 끄집어낸다. 괴로워서 잊고 싶었던 것도 차마 말 못 해 담아두었던 것도.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우리 안에 잊히지 않는 조각들이었음을 시집을 펼치며 알아챈다. 하염없는 아릿함에 마음이 저려와도 혼자 그것을 삭혀내지는 않도록. 차분히 풀어낸 글의 목소리로 마음을 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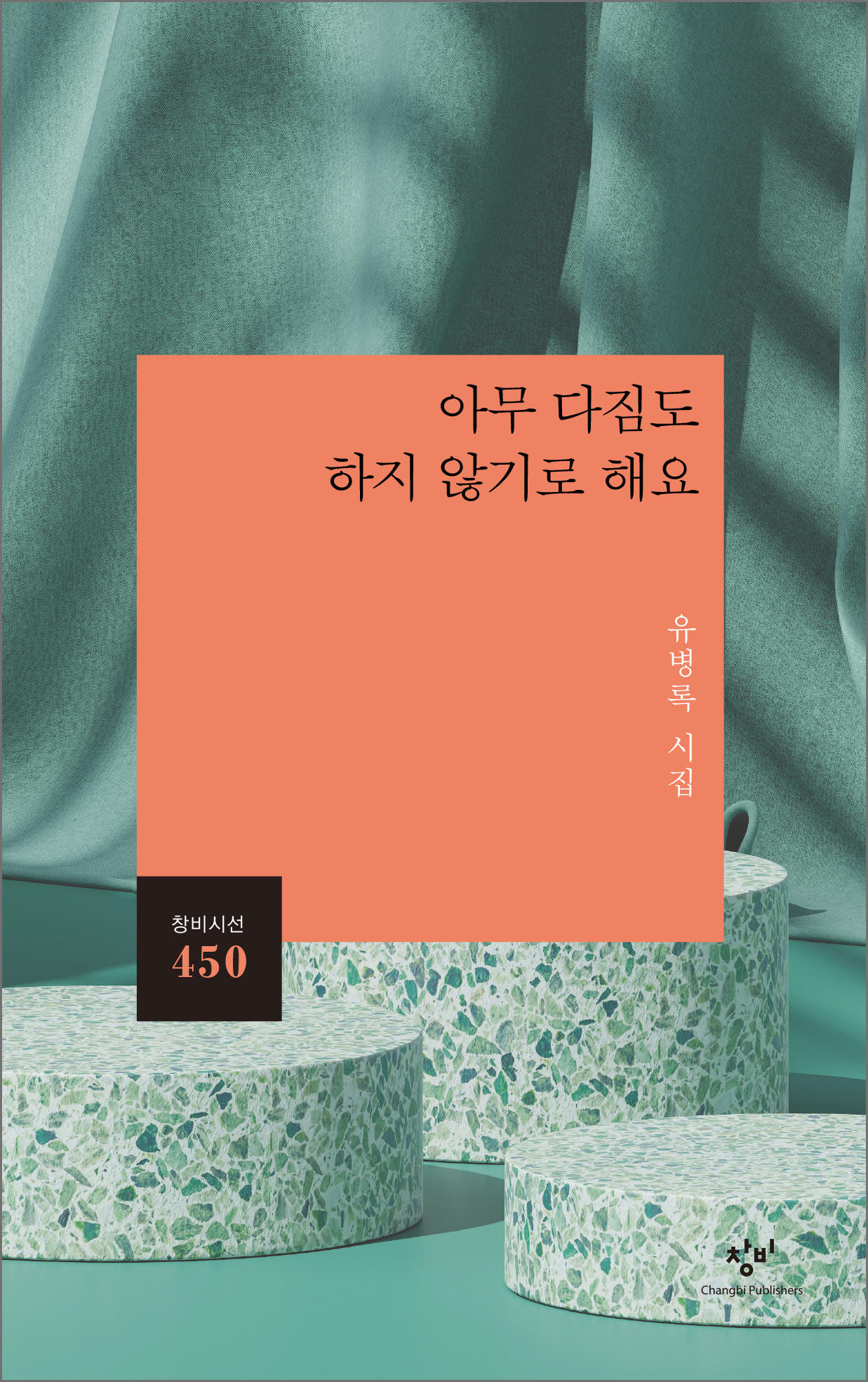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랑이 나에게 - 안경숙 (0) | 2020.10.25 |
|---|---|
| 창령사 오백나한의 미소 앞에서 - 김치호 (0) | 2020.10.25 |
| 두 도시 이야기 - 찰스 디킨스 (1) (0) | 2020.10.19 |
|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2 - 아르놀트 하우저 (0) | 2020.10.12 |
| 박막례시피 - 박막례, 김유라 (0) | 2020.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