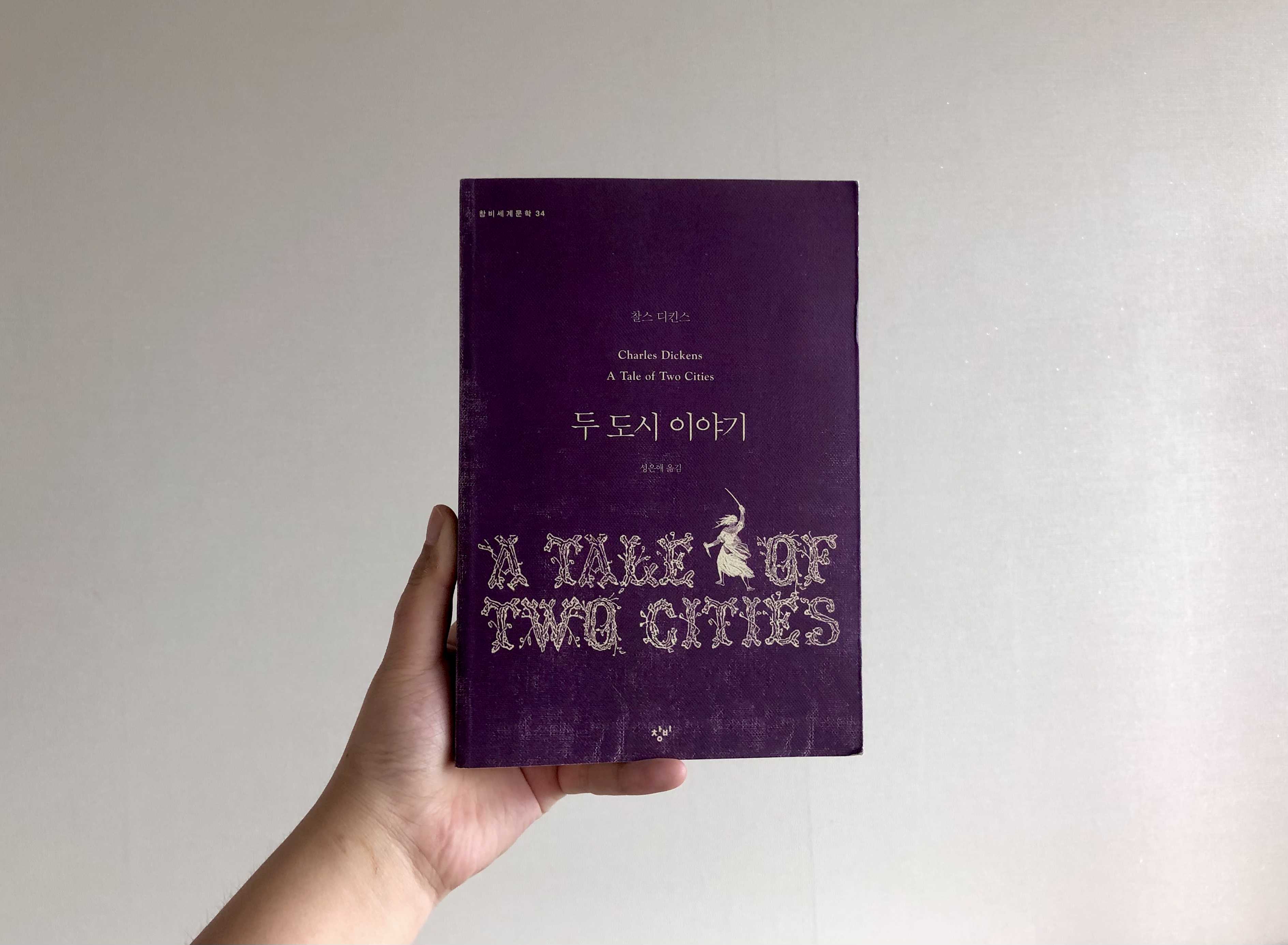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1859). Changbi Publishers
* 창비에서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줄거리도 모르고 그냥 펼쳐본 책이었다. 덕분에 3장이 넘어가도록 무슨 이야기를 풀어낼 것인지 감도 잡지 못했고 책 제목을 인터넷에 검색해볼까 하고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사실 지금도 정확히 딱 무어라 말하긴 참 어렵다. 절반을 넘게 지나온 페이지들이 한가득인데도 말이다. 그래도 찰스 디킨스가 전하고 했던 딱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
계속해서 등장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죽어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겠지 싶다.
자극을 위한 소재로 철저하게 개인적인 슬픔으로 지나치게 만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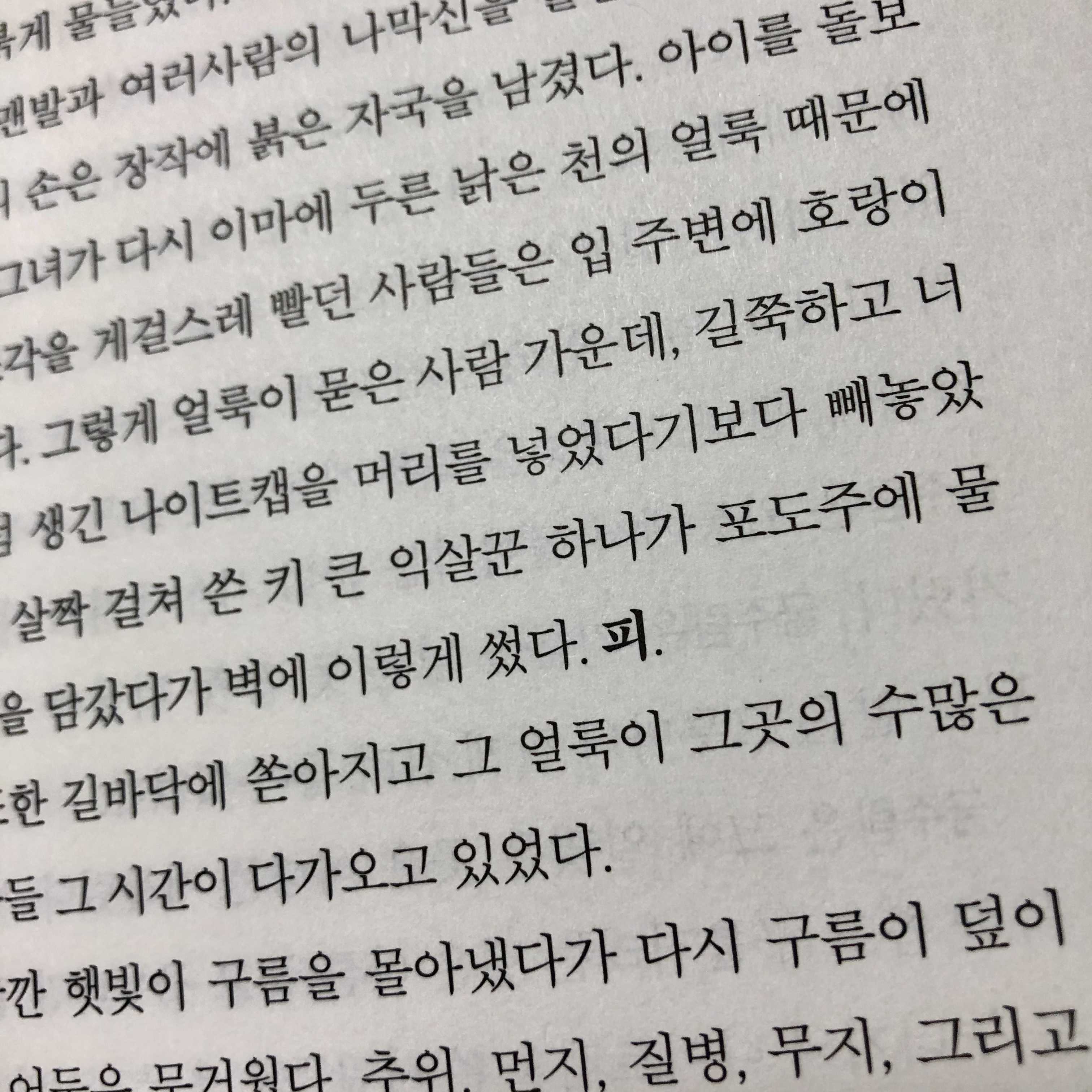
너 나할 것 없이 뛰어들어서 길가에 흐른 검붉은 물줄기를 따라다니고 흥겨워하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신나는 것은 아니었다. 처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오만일까. 왁자지껄하게 모여든 군상 안에는 노쇠한 사람도, 아이도, 엄마도 있었다. 머리띠를 풀어내어 축축이 적시고 그것을 다시 아이의 입안에 짜넣는 손길에는 거침이 없었다. 흥겨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춤을 춰대는 모습이 눈앞에 생생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는 꿈이었다. 신기루 같은 것. 어쩐지 지나간 후에 더욱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짧고 달았던 꿈이었다.
길가에 있었던 이유로 사라진 아이는 그저 금화 한 닢의 존재였다. 그냥 두고 지나치면 될 일. 마차에서 내린 것도, 살핀 것도 우글우글한 군상일 뿐이다. 엎드려 울고 슬퍼해주는 것은 부모만이다. 더 이상 깊게 들어오는 것은 아무도 없다. 스쳐 지나가는 배경의 일부 같은 것일 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더라. 누군가는 그렇게 말한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어디선가 익숙하게 본 것 같지는 않은지?

세상을 등지려 한 부모는 신문 기사에 등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세상에 남은 것들이 살아갈 날이 불쌍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도덕성의 문제인가. 그것이 도덕성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티브이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이 말했다. 사는 게 뭣 같아도 죽지 말고 살아봐야 한다고.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나는 혼란스럽다. 무엇이 과연 정답이고 무엇이 맞는 길인지.
그 연유는 어찌 되었든. 죽은 것은 어린아이 들이다. 이것이 하나의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 어찌 되었든 이 시기는 분명 존재했으며 소설로 치부하고 넘길 것이 아닌 그가 담아내고자 한 이야기는 분명 존재했음을 알기 때문이다. 보편적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형태가 정형화되고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이다. 그럼에도 이 오랜 세월과 다르지 않은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자아내는 참혹함과 뱉어낼 수 없는 입안의 쓴 맛이 괴로움을 자아낸다.
아직 남은 절반의 이야기에 바라게 된다. 과오를 아는 이들이 잘못을 모르는 것들에게 절절한 슬픔을 되돌려 주기를 말이다. 하나 둘 맥락이 잡혀가는 이야기에도 변두리에 남은 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쉽게 생각을 돌리지 못하는 이 씁쓸한 기분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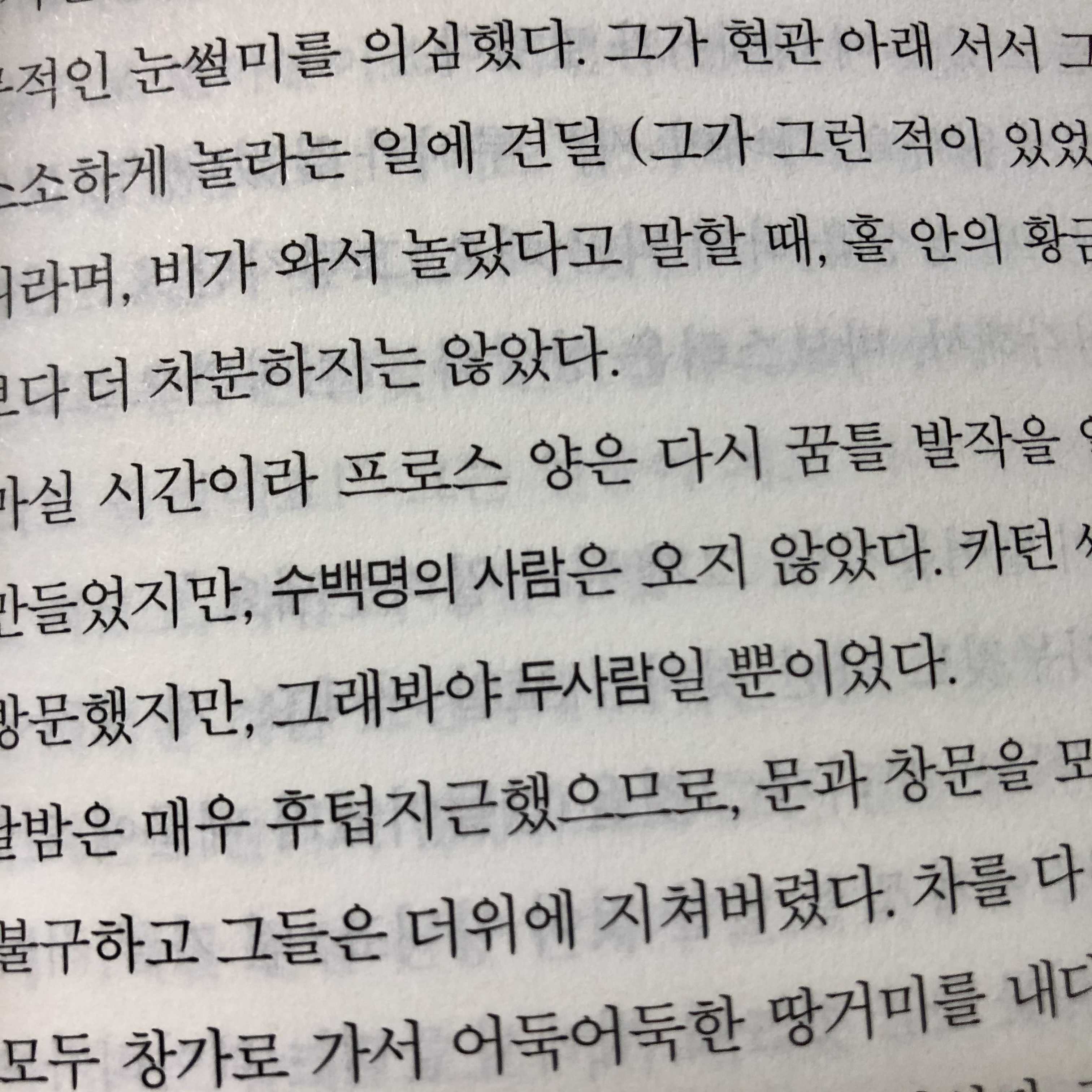
개떼, 파리떼, 벌레.
박탈당한 삶, 조각나버린 개인.
두 도시의 이야기를 채워나가고 있는 것은 외면받고 쉬쉬 되는 존재들이다. 처음 들었을 때의 묵직한 느낌에 배로 더 많은 것들이 가슴을 누른다. 가능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익숙해진 모습은 슬픔을 자아낸다. 지루하게 터놓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역사서가 아님에도 디킨스의 글은 머릿속을 맴돌아 다닌다. 사이사이에 치고 들어오는 이 모습들이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라고.
내가 빠져드는 이 인물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식사를 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보며 속이 쓰리다. 자연스럽게 바깥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좋은 이 인물들에 동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순수하게 이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들 역시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말미암아, 그것을 위로 거리로 삼아서 행복한 결말을 기대해도 되는 것일까. 다음의 찾아올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하지만 또 그만큼 괴로운 것일까 두려움도 몰려온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창령사 오백나한의 미소 앞에서 - 김치호 (0) | 2020.10.25 |
|---|---|
| 아무 다짐도 하지 않기로 해요 - 유병록 (0) | 2020.10.25 |
|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2 - 아르놀트 하우저 (0) | 2020.10.12 |
| 박막례시피 - 박막례, 김유라 (0) | 2020.10.08 |
| 우리 술 한주 기행 - 백웅재 (0) | 2020.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