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란츠 카프카: 변신 ˙ 단식 광대(2020). Changbi Publishers
* 창비에서 제공받은 책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오래된, 나무로 벽을 만든, 집에서 자던 날. 발밑에 들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핸드폰 플래시를 비춘 순간. 온몸에 타고 흐르던 소름을 잊지 못한다. 순식간에 온몸을 타고 흐르는 말 못 할 끔찍한 순간에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불을 켜니 곳곳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날 나는 벽, 천장, 어느 곳도 그것들이 가지 못할 곳은 없다는 것을 절절히 알게 되었다. 도저히 잠들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빨리 아침이 와서 이 상황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써 눈을 감아보는 것밖엔 없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한 장소가 끔찍한 기억으로 버무려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치를 떤다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딱 이를 기점으로 비슷하게 반짝이는 것, 더듬이, 다리만 봐도 식은땀을 흘리게 된 것이다.
나는 벌레라면 질겁을 했다. 장난 삼아 메모지에 그려보는 동그라미에 선을 몇 개만 그어봐도 기분이 이상했고 강의자료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용히 갖가지 것으로 덮어두기에 바빴다. 그것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다. 내가 그것들보다 크다는 점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너무 다른 생물들을 마주하고 있기에 나는 무엇보다 작게 변해 도망가고 싶었으니까.

가벼이 매도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첫 장을 읽자마자 책을 덮고 밤에 읽기를 포기했다. 자기 전에 이를 읽고 나면 분명 꿈에서의 내가 변신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꾸 핑계를 대며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계속 몇 장 남지 않은 페이지를 붙들고 금방 끝나기를 바랐었다. 아침은 아침이라 고역이었고, 저녁은 저녁이라 그랬다. 그레고르의 변신이 점점 더 완전해질수록 함께 괴로워졌다. 인간의 말로 인간의 생각을 하는 모습에 안심하며 나 역시 인간이었을 그를 상상했다.
갈 곳 없이 계속되는 헌신이 기이했고, 닿지 못하는 보살핌이 슬펐다.
우리 온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살아가는 가족이 어느 한순간에 이 끔찍한 변신을 겪게 된다면 나는 이들처럼 할 수 있을까. 결코 빈 말, 거짓으로라도 웃어줄 수 없을 것이며 만지고 끌어안아줄 수 없을 것이다. 비겁하게 도망가서 애써 잊고 살거나 함께 끝을 맞이하고자 했겠지. 미쳐버린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전혀 현실감이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판타지, 환상 아닌 환상이 담긴 이야기가 보여주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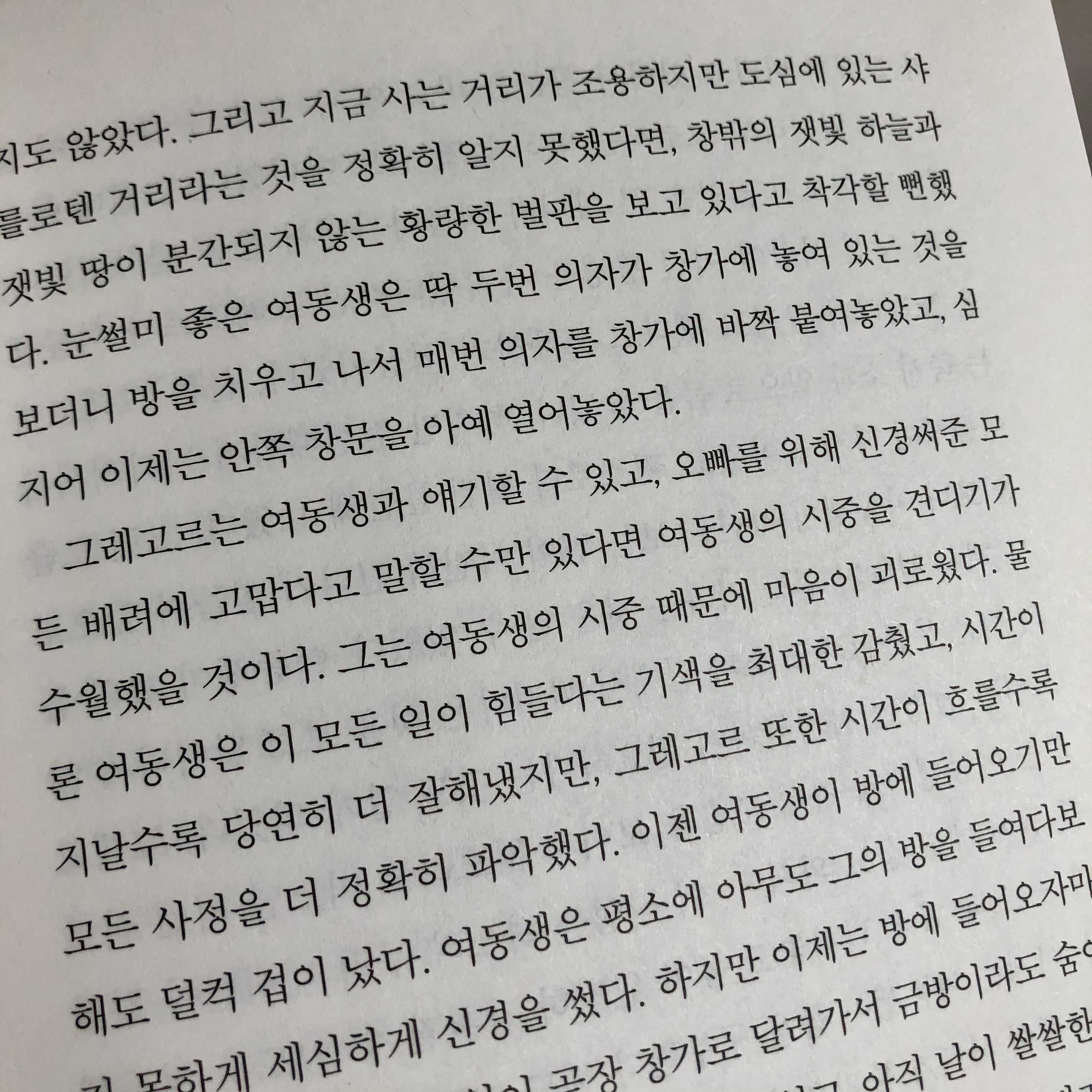
어릴 적 개미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다. 흙과 나뭇잎, 거기에 더해진 살아 움직이는 개미는 놀이터에서 하는 장난의 재미를 배가시켜주었다. 순수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교육받지 못한 날것의, 본능적인 잔인함이 아이들 사이에 만연했다. 아무렇지 않게 손과 발로 장난질을 했던 그때와 달리 나는 겁쟁이로 성장했다. 아주 작은 날파리도 잡기 어려웠고 그보다 더 작은 것들 역시 손대기 쉽지 않았다.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하는 살생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생명의 중함을 논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딱히 만류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게 또다시 죄책감을 안겼다.
마음을 억누른 것이 단순히 살생에 대한 거부감뿐이었나 생각해보면 꼭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그것들이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든 지금 하는 살생이 언젠가 큰 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화분에 생긴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약을 치고 있으면 요란하게 움직여 대는 모습이 나에게로 달려드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 그네들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려는 나를 원망하는 소리가 밤새 찾아오지는 않을까 찝찝하기 그지없었다. 윤회를 배우며 속으로 콧방귀를 뀌다가도 내가 그것들처럼 거대한 생명체 앞에 무력한 존재가 되어 고통스럽게 죽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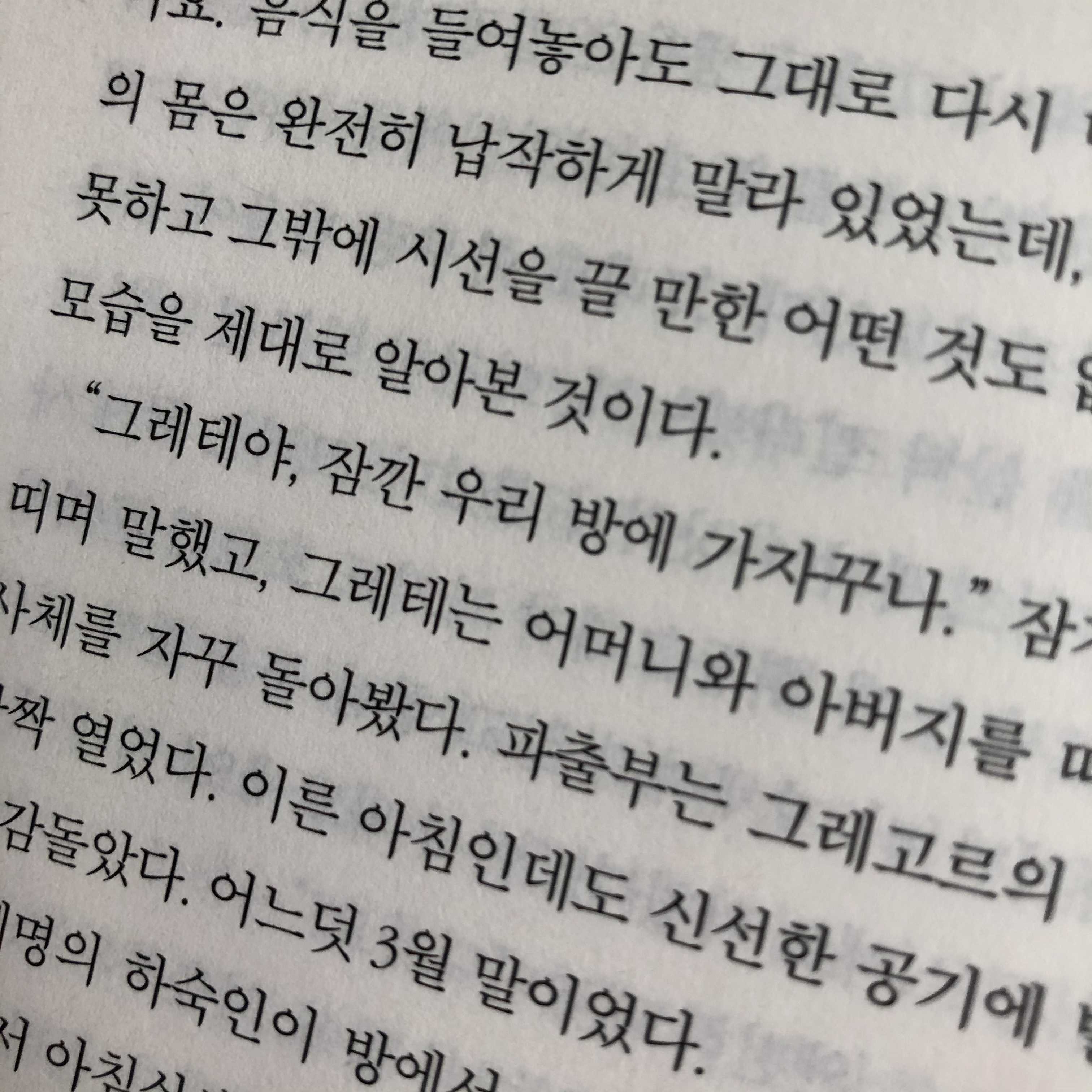
한동안은 역겨운 상상을 몰아내기 어려워 입맛도 떨어졌고 기분이 이상했다. 그동안 가져온 두려움과 걱정을 한데 모아 소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뜨고 보니 하찮은 존재가 되어 버린 후 기억해 주는 이 없이 그레고르는 말라비틀어졌다.
티브이를 보면서 다음 생에는 털북숭이 귀여운 생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가볍게 내뱉는다. 무슨 짓을 하든 개의치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좋은 먹이와 좋은 공간에 마구 퍼주는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 웬만한 인간들보다 좋아 보이는 팔자가 부러워지기도 한다. 사실, 아무도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저 역사에 따라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낱낱이 뜯어보듯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대하고, 함께 행복하다고 말한다. 멍청하기 그지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쉽게 뱉지 말자고 깨닫게 해 준 것이 웹툰 <개같은 세상>이었다. 프란츠 카프카는 그보다 더 깊고 공허한, 미처 상상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을 일상으로 끌어들여온다.
누구도 벌레로 태어나고 싶다는 꿈은 꾸지 않는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막례시피 - 박막례, 김유라 (0) | 2020.10.08 |
|---|---|
| 우리 술 한주 기행 - 백웅재 (0) | 2020.10.05 |
| 어른들의 거짓된 삶 - 엘레나 페란테 (0) | 2020.09.23 |
| 갈라진 마음들 - 김성경 (0) | 2020.09.21 |
| 이만큼 가까운 프랑스 - 박단 (0) | 2020.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