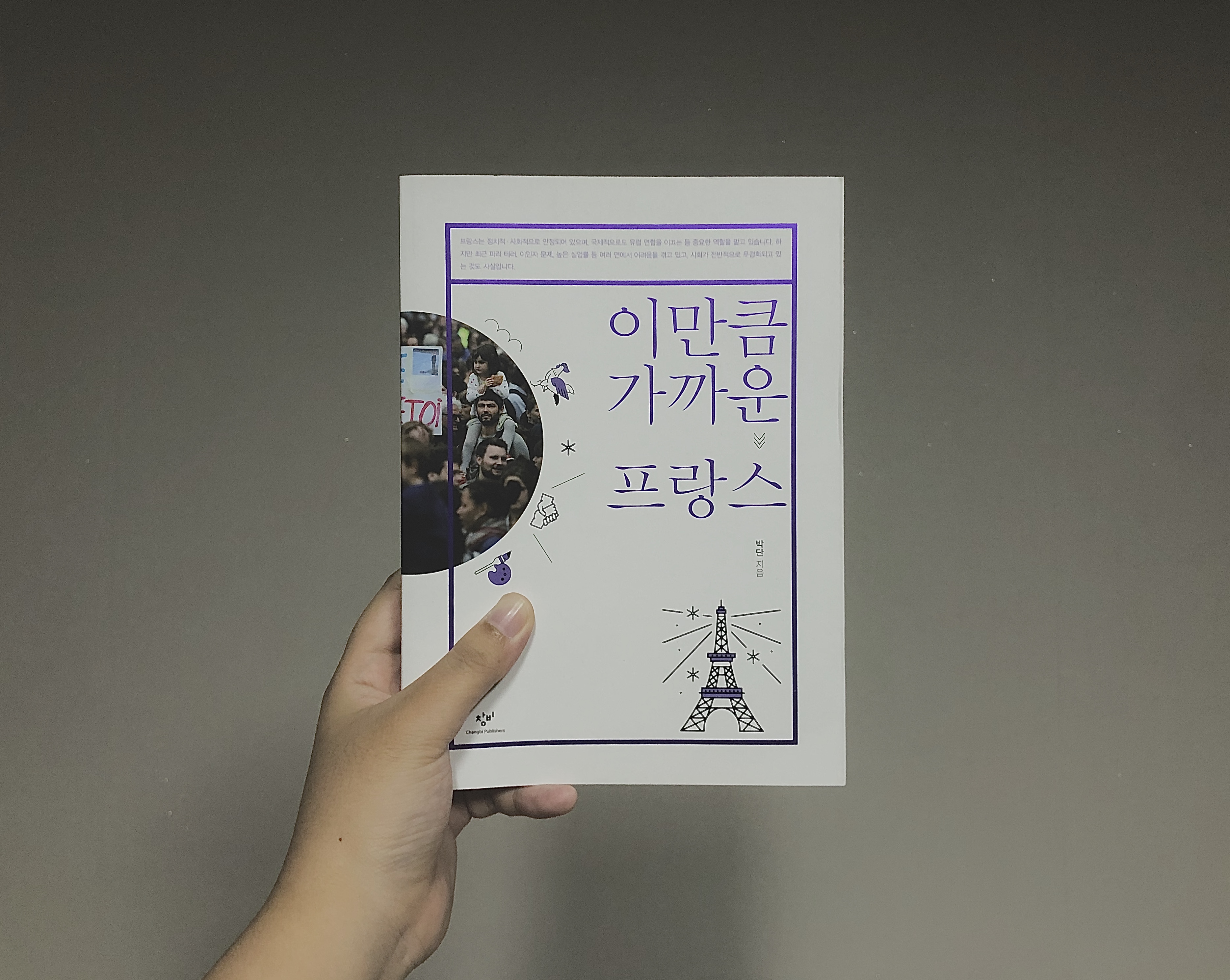
박단: 이만큼 가까운 프랑스(2017). Changbi Publishers
* 창비에서 제공받은 책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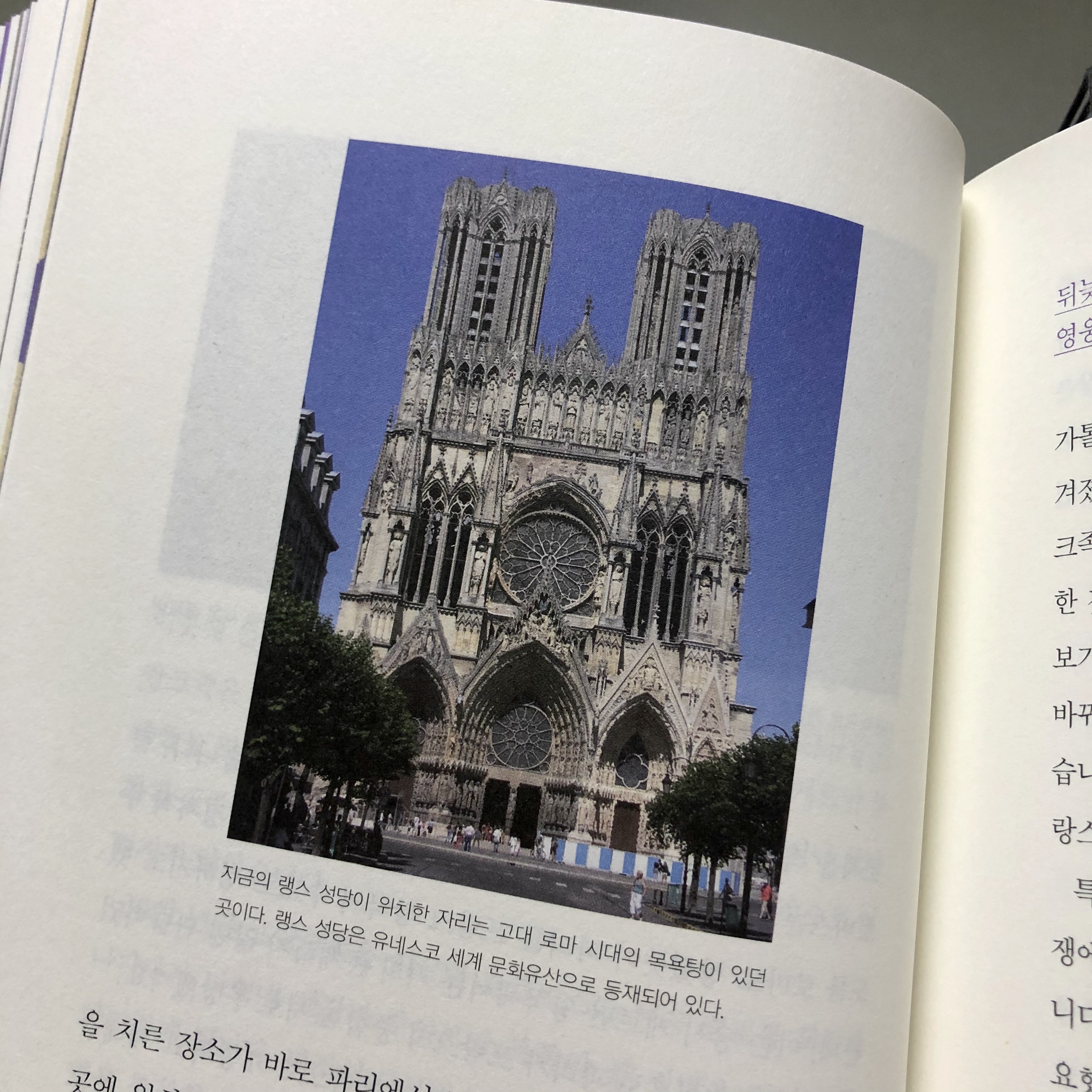
'프랑스'는 언젠가 여행을 가보고 싶었던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영화 <테이큰>을 보기 전까지는. 친구와 함께 떠난 나라에서 즐거운 시간만을 상상했을 터인데 납치를 당해서 끔찍한 일을 겪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로망 속에만 잠겨있을 것이 아니라 저것이 진짜 프랑스의 모습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영화가 내게 다민족 국가로의 프랑스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었다. 자유로운 낭만이 가득하기만 한 곳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어쨌든 그곳도 현실이었으니까.
「이만큼 가까운 프랑스」는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된 프랑스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이었다. 열려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를 적용하는 모습은 관대해 보이기만 했다. 처음에는.
어릴 땐 복지 국가로 유명한 유럽 국가들을 찬양하며 그들 국가를 부러워하곤 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서서히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다. 그래도, 이제 그게 마냥 좋은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국가의 개입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하기 마련이니까.

이상을 현실로 가까이 끌고 오기 위해서는 지녀야 할 이 숙제들을 프랑스 역시 지니고 있었다. 실업은 낮춰야 하고 동시에 노동의 문제와 개인의 권리는 지켜야 하고. 영원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딜레마였다. 나는 사회˙정치˙경제와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에 이제 조금씩 주워 삼키고 있는데, 딱 좋은 말이 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무엇을 택하든 국가의 결정은 완벽에 다다를 수 없고 찰나 그것을 만족시켰다고 할지라도 금세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것들을 돌려가면서 다른 정권이 다른 것들을 빙빙 틀어막기 반복하는 것 같달까.
너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만 진학 한 후가 더 어려운 것이라 진학률이 조정된다니. 딱 대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닐까. 힘겹게 기를 써가며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대학에 왔지만 정작 와서는 머리와 마음에 무엇이 담기는 지를 4년의 시간 동안 이해하기가 어렵다. 내가 바란 대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가 벌써 희미하다.
- 알기 위하여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 예술 작품은 꼭 아름다워야 하는가?
- 권리는 옹호하는 것은 곧 이익을 옹호하는 것인가?
고등학교의 졸업 관문이자 대학의 진입 관문이라는 이 세 주제를 앞에 두고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고민하기 위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나라에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숙고하여 정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뿐이다. 논술을 위해 수없이 트레이닝을 받은 학생들에게나 가능한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마음과 생각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요즘이다. 소위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 일 학년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윤리 의식이라고 교수님들마다 돌아가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난다.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것, 스스로 깨우치기엔 부족했던 그것, 그것 때문에 잘못 틀어져 가는 균열들이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과제를 안겨준다.

하지만 뭐 깨버리는 구석도 있는 게, 마크롱 등 대통령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의 학력이 닮아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고민과 생각의 기회를 내어주고 갈수록 더 심화되는 교육의 틀을 잘 따라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특권층을 형성했다는 점엔 어쩔 수 없이 질려버렸다. 이것도 딜레마라면 딜레마인가. 교육의 완전한 평준화가 이뤄질 수는 없음을 알고, 사회의 필요에 의해 그것이 지양되어야 함은 알고 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모두가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그곳도 마찬가지로 엘리트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주요직 들을 꿰차고 있다는 것은 씁쓸했다. 삶의 대물림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로 같은 코스를 따른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까 봐 그게 더 무서웠다. 익숙함에 물들어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긴 한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테니까.
다만 그들이 특권층에 도래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활사에 익숙한 내 시각 때문인 거라고 하면 정말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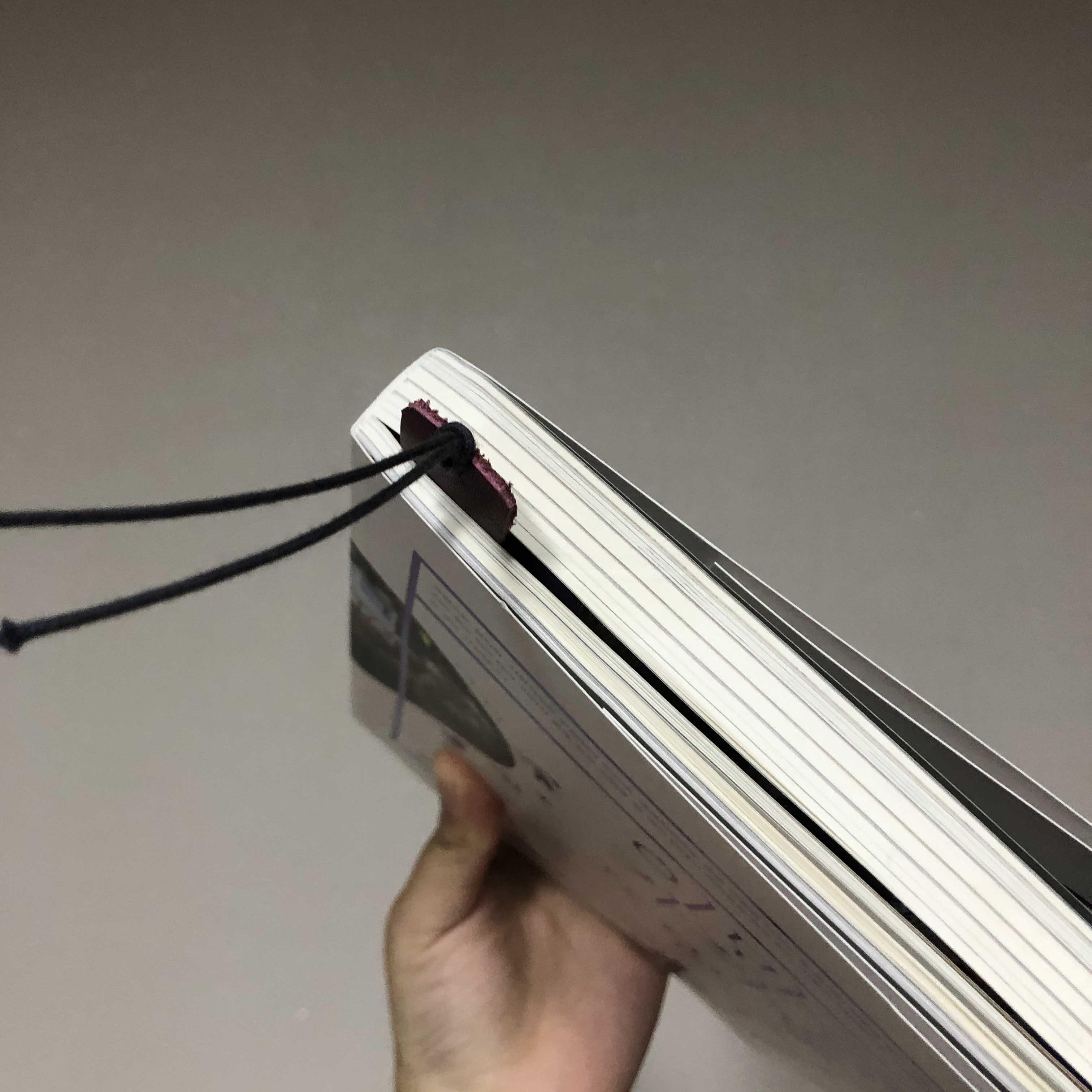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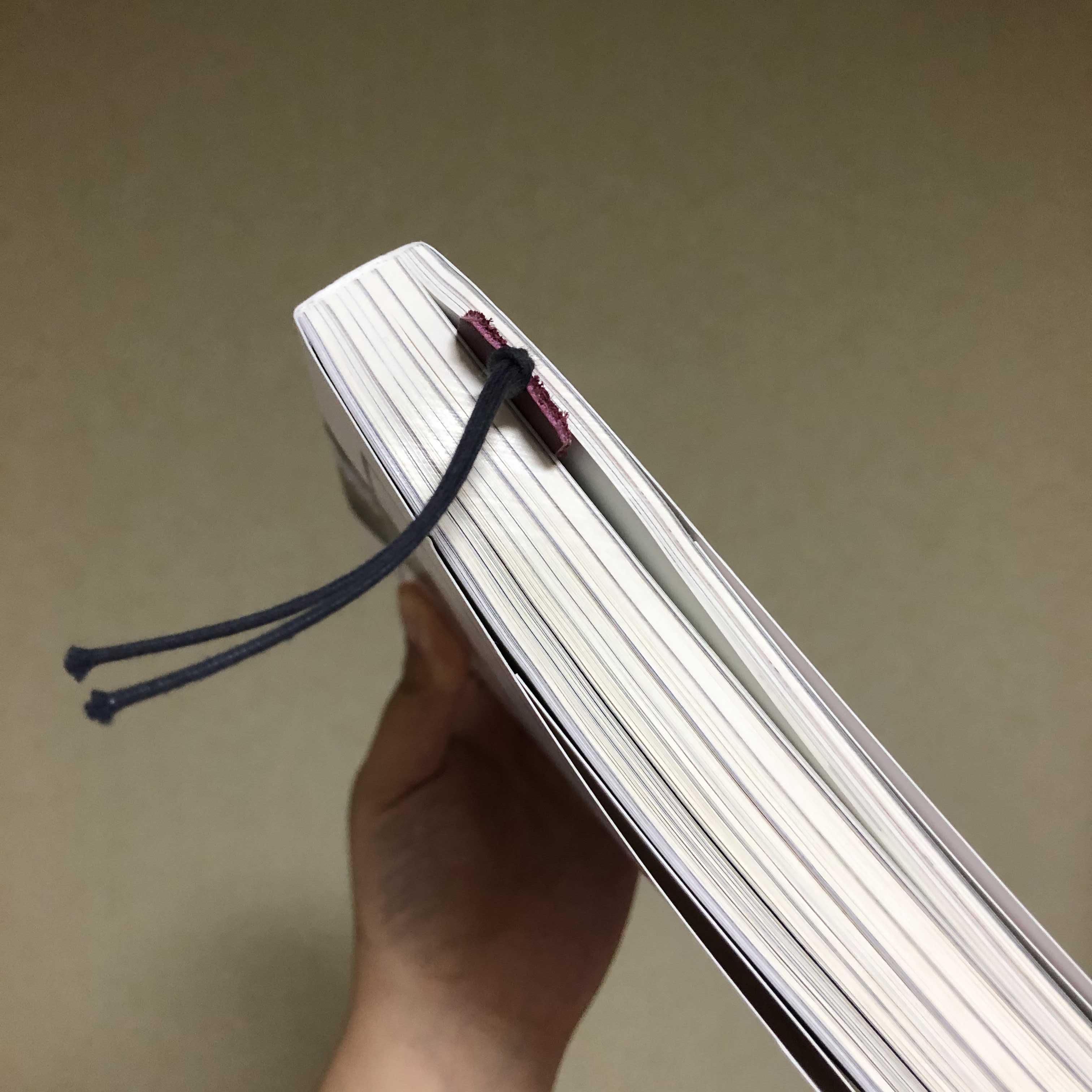
마음껏 선망하라고 한 내용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덮여온 두려움들을 가중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딱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프랑스 자체를 바라보는 책이었다. 덕분에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달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동등한 선에서 많은 이야깃거리들을 같이 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가깝지 않게 그렇다고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로 다가선 프랑스를 시간이 지나면 더 이해할 수 있게 될지.
지금이 가장 많은 것이 변하는 시기여서 일까. 출간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책이지만 조금 더 최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테러도, 코로나도, 경제도 모든 것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려나.
프랑스 헌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는, 종교 중립적인, 민주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공화국'입니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른들의 거짓된 삶 - 엘레나 페란테 (0) | 2020.09.23 |
|---|---|
| 갈라진 마음들 - 김성경 (0) | 2020.09.21 |
| 젊은 베르터의 고뇌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0) | 2020.09.07 |
| 윤곽 - 레이첼 커스크 (0) | 2020.08.31 |
| 베토벤이 아니어도 괜찮아 - 최정동 (0) | 2020.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