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젊은 베르터의 고뇌. Changbi Publishers
* 창비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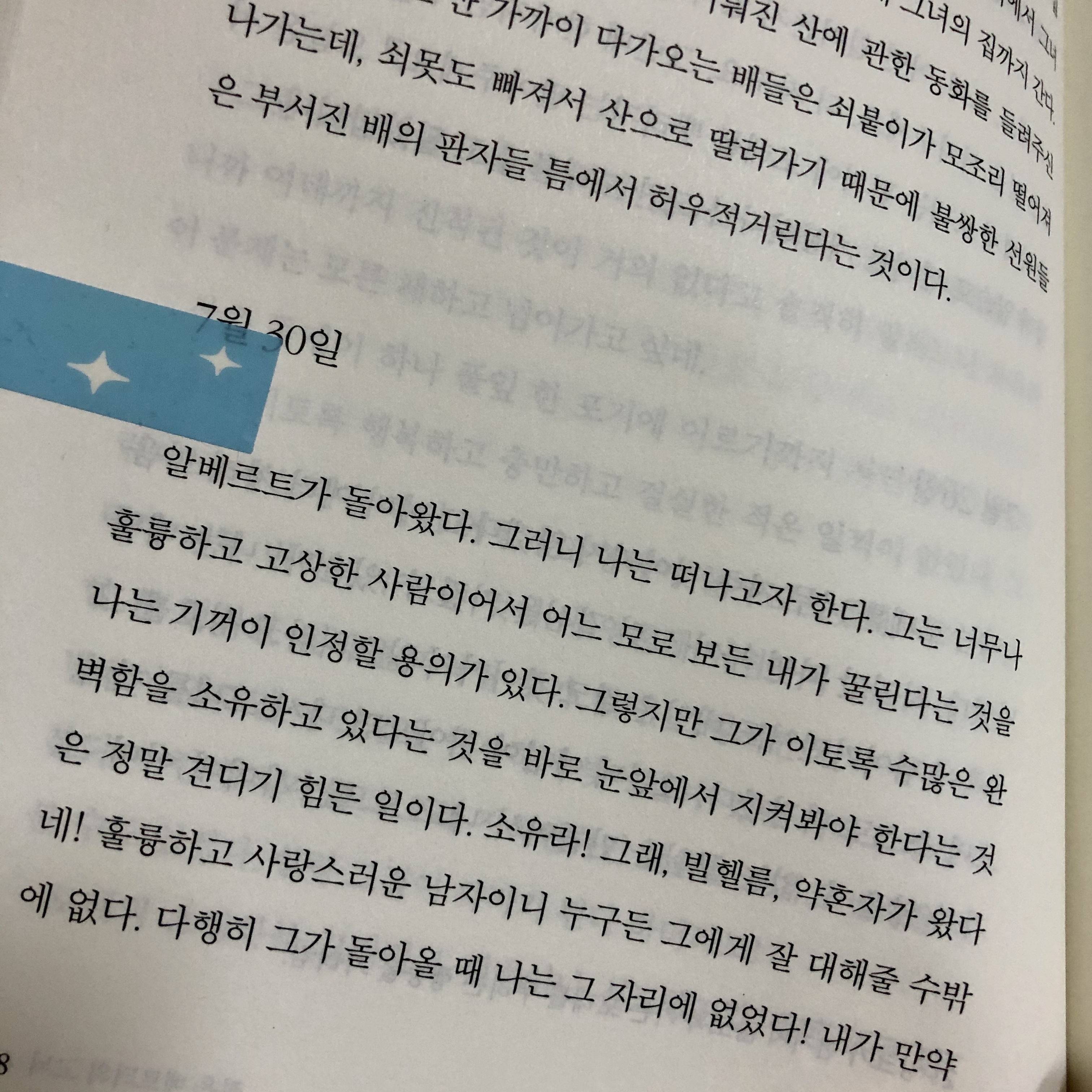
괴로워하는 베르터를 보며 내내 생각했다. '「빌레뜨」의 브레턴 선생처럼 깨어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좋을 텐데.' 자신이 너무도 사랑한 그 모습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 깨닫는 순간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테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여성이었다. 진심으로 주위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녀는 베르터가 가장 가치를 두는 소중한 것들의 현신과 같았으니. 내가 바라본 베르터는 그녀와 너무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계층에 중시하여 다른 것들을 하대하는 인간들은 질색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는 스며들어가길 원했다. 길에 앉아 가만히 아이들을 지켜보기를 좋아했고 기꺼이 어울려 있기를 좋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변해버린 그의 모습이 조금 무서웠다. 자신이 중시하는 것들과 평온한 일상, 그림을 아끼는 모습은 점차 옅어져 갔다. 급격하게 냉소적이게 되다가도 우울에 빠져있는 모습이 잦아졌다. 자신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은 없어 보였던 것일까. 베르터가 더욱더 비틀리게 된 것은 알베르트를 만난 뒤부터였던 것 같다. 다른 절절한 사랑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도 알베르트가 어떤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게 있다. 이를테면 로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거나 이상한 결점이 있는 모습.
김이 새버린 건 베르터와 나였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알베르트는 진심을 담아 로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감성적인 로테와 비슷한 것은 베르터이고 그래서 둘의 마음이 맞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어울리는 것은 알베르트였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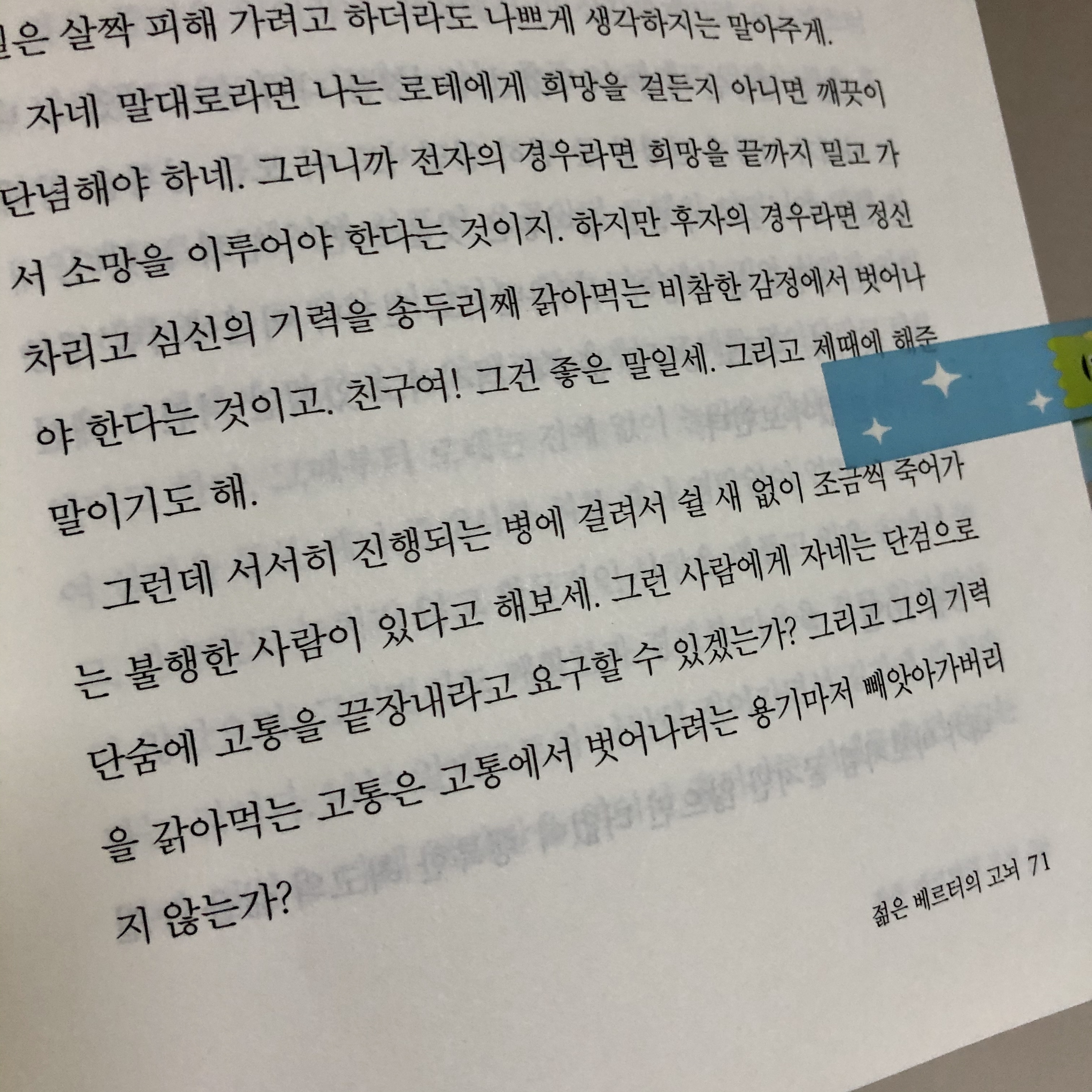
누가 봐도 안될 일이었고 그건 베르터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해야 함을 알지만 할 수 없는 것, 이해는 하지만 행할 수 없는 것. 그 속에서 베르터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를 갉아먹은 것은 자신이었고 벗어날 수 없는 힘이었다. 빌헬름이 보기에 또 독자가 보기에 베르터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얼른 떨쳐내라고,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느껴보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오지랖이었다. 베르터에게는 선을 넘은 지나친 참견이었다.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단번에 생을 끝내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크기로 베르터에게 사랑을 멈추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나는 그와 같은 절절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에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게 된다. 미워할 수 없는 알베르트와 사랑하는 로테를 보면서 가장 잘못됨을 인지하고 괴로워한 것은 다름 아닌 베르터였을 테니.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만들어 더는 곁에 있을 수 없음을 알기에 거리를 두려 했던 베르터의 노력이 끝내 힘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차차 잊길 바랬건만 다시 로테에게 편지를 쓰고 돌고 돌아 다시 그녀를 보기 위해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된 베르터가 더욱 안타까워진다.
너무도 괴로워서였을까. 점차 생각과 감정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그를 보는 것은 내게도 고통을 안겨주었다. 따뜻하고 깨끗한 성정을 가진 그였음을 알고 있었는데 점차 변해가는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알베르트의 모습까지 의심하며 로테를 향한 그를 고깝게 바라보는 베르터의 모습은 지나쳤고, 질투로 어그러졌다고 밖에 할 수가 없다.

가장 나쁘다고 느꼈던 것은 로테다. 처음부터 베르터의 사랑이 짝사랑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로테도 진심으로 베르터를 아끼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지만 로테는 알베르트를 남편으로 맞이하길 꺼린 적이 없었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베르터는 함부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한 채 그녀 주위를 맴돌았던 것일 것이다. 로테와 베르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공감하고 행복한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릴 때도 있었지만 내가 가져보지 못한 숭고한 우정의 흐름일 것이라 여기고 납득하려 한 부분이 많았다. 그게 로테의 진심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책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로테가 자신의 속마음을 조심히 털어놓았을 땐 어이가 없었다. 주변의 친구들을 소개하여 베르터가 떠나가는 것을 막아보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베르터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은근한 소망이 자신의 진심'이라니. 베르터가 진정으로 단념하고 선을 알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로테였을지 모른다. 물론 베르터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로테가 자신에게 직설적으로 냉정하게 대했다고 한들 쉽게 떨쳐내지는 못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베르터가 기대를 갖고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어 어쩔 줄 모르게 방치한 것에는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그 성별이 어떠한 것이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에 대하여 주도권을 진 강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원치 않는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고 한들, 그렇다면 그것을 힘껏 내던져야 한다.

지금과는 다른 시대의, 지금과는 다른 사랑의 형태가 절절히 묻어나는 글이다. 안네의 일기가 떠오르는 편지 형태의 또 다른 이를 향한 글이라는 점이 새롭기도 하고. 그러나 마냥 예찬할 수는 없는 이유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가장 경악을 했던 건 이런 부분. 사랑해 마지않는 여주인을 생각하다가 결국 그녀를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했다는 이야기. '정복'이라는 말과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말. 끔찍하다. 소설을 읽다가도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듯 깨어나서,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대목이었다. 여주인이 새 머슴을 들여 결혼을 하든 말든 그따위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것이 진실하다고 하여 힘으로 어찌해보려 했다는 것이 놀라운 지경이다.
베르터 역시 그런 충동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애끓는 사랑을 하고 싶어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로테에게 닿고 싶어 한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 그는 로테에게 키스를 한다. 몇 년 전의 내가 이 책을 봤다면 절절할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안타까운 사랑 소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보기엔 폭력적인 장면일 뿐이다.
베르터에게 자신의 진심을 내비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놓아주지도 않아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본 로테와 진심이라는 이름 하에 결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위를 떠나지 못한 베르터 모두를 보며, 내게 가장 안타까워 보이는 것은 알베르트뿐이다. 알베르트에 대한 다른 이들의 시선을 본다면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다시 불행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사랑해서 행복하고, 사랑해서 괴롭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게 하는 극점에 있는 사랑의 형태를 담아놓은 소설이었다. 진심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베르터를 표현한 괴테의 모든 글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지금으로부터 퇴화하여 이 같은 사랑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또다시 볼 땐 또 다른 감상을 하게 될지. 딱 그 시절의, 딱 그 사랑의 낭만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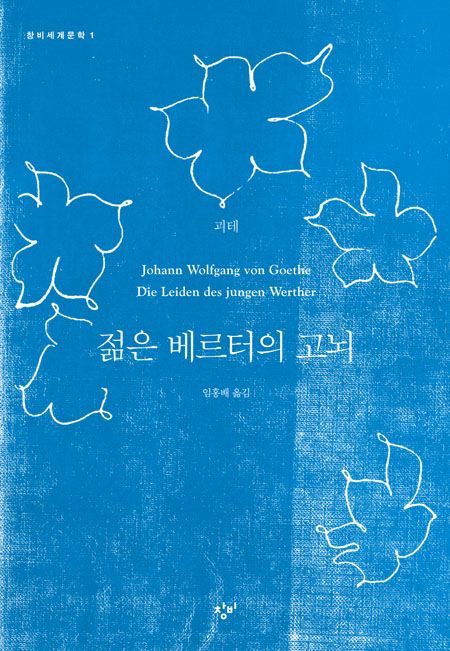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갈라진 마음들 - 김성경 (0) | 2020.09.21 |
|---|---|
| 이만큼 가까운 프랑스 - 박단 (0) | 2020.09.14 |
| 윤곽 - 레이첼 커스크 (0) | 2020.08.31 |
| 베토벤이 아니어도 괜찮아 - 최정동 (0) | 2020.08.25 |
| 에디 혹은 애슐리 - 김성중 (0) | 2020.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