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중: 에디 혹은 애슐리(2020). Changbi Publishers

발랄한 진분홍빛 커버 현혹되기 쉬우나 속내는 그렇지 않다. 밝은 빛깔의 소설집 속에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어딘가 뒤틀린 듯 보이는 인물들이 자조적인 소리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아픈 것은 마음이다. 이웃의 이야기를, 친구의 이야기를 적어보면 이렇게 될까. 이상과 행복은 어려운 것이라지만 환상적인 이 글은 오히려 지독히 현실적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실 중에서도 지독히 아픈 현실이 가득하다.
정상의 범주를 말하기야 어렵다지만 잠시 두리뭉실한 그 정의를 빌려오자면, 메마른 비정상적 주인공들이 하는 조용한 호소의 모음이다.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행복에 되려 불안해하고, 아니 어쩌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음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다. 격렬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 안쓰러운 이들 마음 표면의 갈라짐이 손끝에 느껴지는 듯싶다. 초년에 자리 잡은 아픈 것들은 철저히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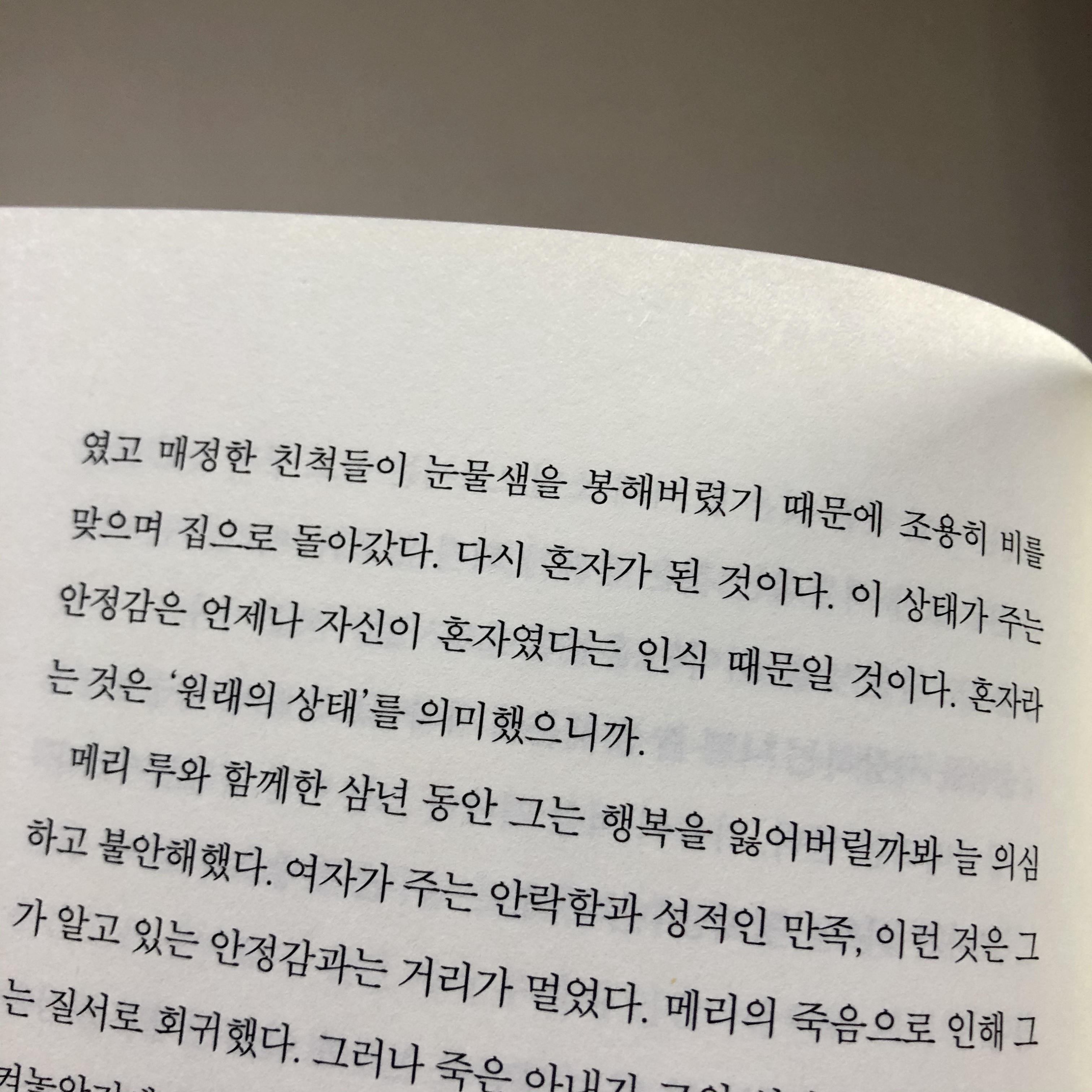
행복함에 있어 더욱 불안해지고 슬픔과 외로움에 안정을 느낀다라. 감정을 대함에 있어 담담해지는 것은 성장과 같은 것이지 싶다. 슬프다고 쉽게 눈물을 흘려선 안되고 답답하다고 소리를 질러댈 수도 없다. 우린 항상 조금 더 침착하기를, 조용하고 예의를 갖춘 어른이 되길 가르침 받았다. 느끼는 만큼 표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건 아주 일부에게나 허용된 것이었다. 감정적인 것은 어린아이 같은 부끄러운 짓이었으니.
어느 날 독서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의 주제는 '어떻게 우는가'였다. 혼자 이불속에서, 샤워를 하며, 물을 틀어놓고 안의 것들을 흘려보낸다는 말들 중에 당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슬픈 영화를 찾아보고 되는대로 울어버립니다." 30대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제야 웅성웅성 동조하는 말들이 들려왔다. 모임을 이끌던 호스트가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건넸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에 어려움음 없었나요?" 정말이다. 그는 쌉싸래한 얼굴로 말을 더했다. 남자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마치 금기처럼 느껴진다고. 쓸데없는 젠더 관념의 최상단에 있는 생각일 테다. 남자는 눈물을 보여선 안된다는 아주 낡디 낡은 생각.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은 예전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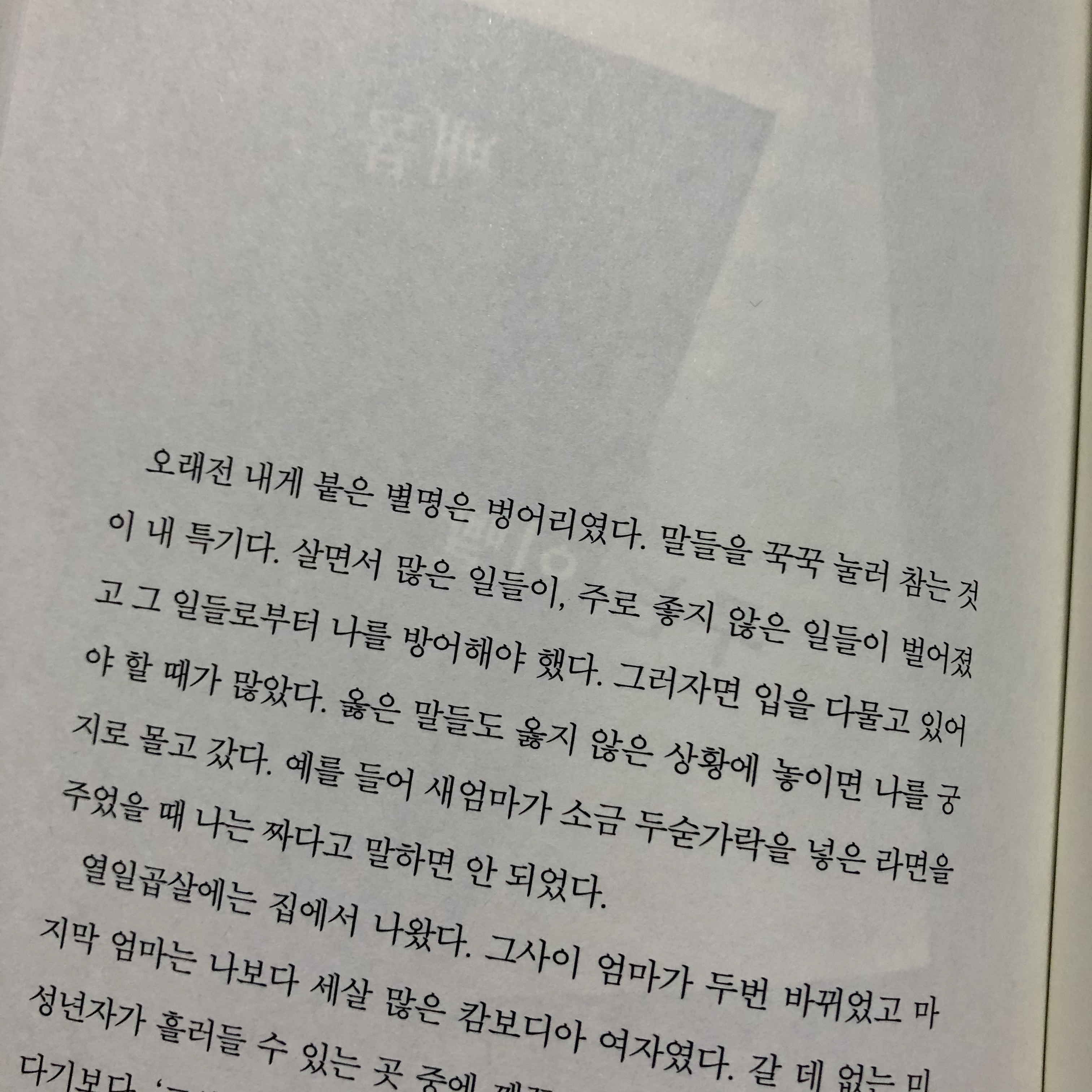
각기 정도가 달리 막혀있는 가슴을 가진 우리들은 건강한 것인가. 그는 마음을 먹고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긴 시간 동안 머릿속을 지배한 뿌리 깊은 세뇌는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군중의 눈물을 말려버렸다. 노력을 해서야 겨우 맘 놓고 엉엉, 울 수 있었다고 했다. 태어나기로서니 울음을 매달고 태어나는 우리가 우는 법을 잊어버리기까지 잔인하게 우리를 옭아맨 것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러니 더 이상 이 소설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답답한 가슴은 이제 너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 더할 나위 없이 현실적인 소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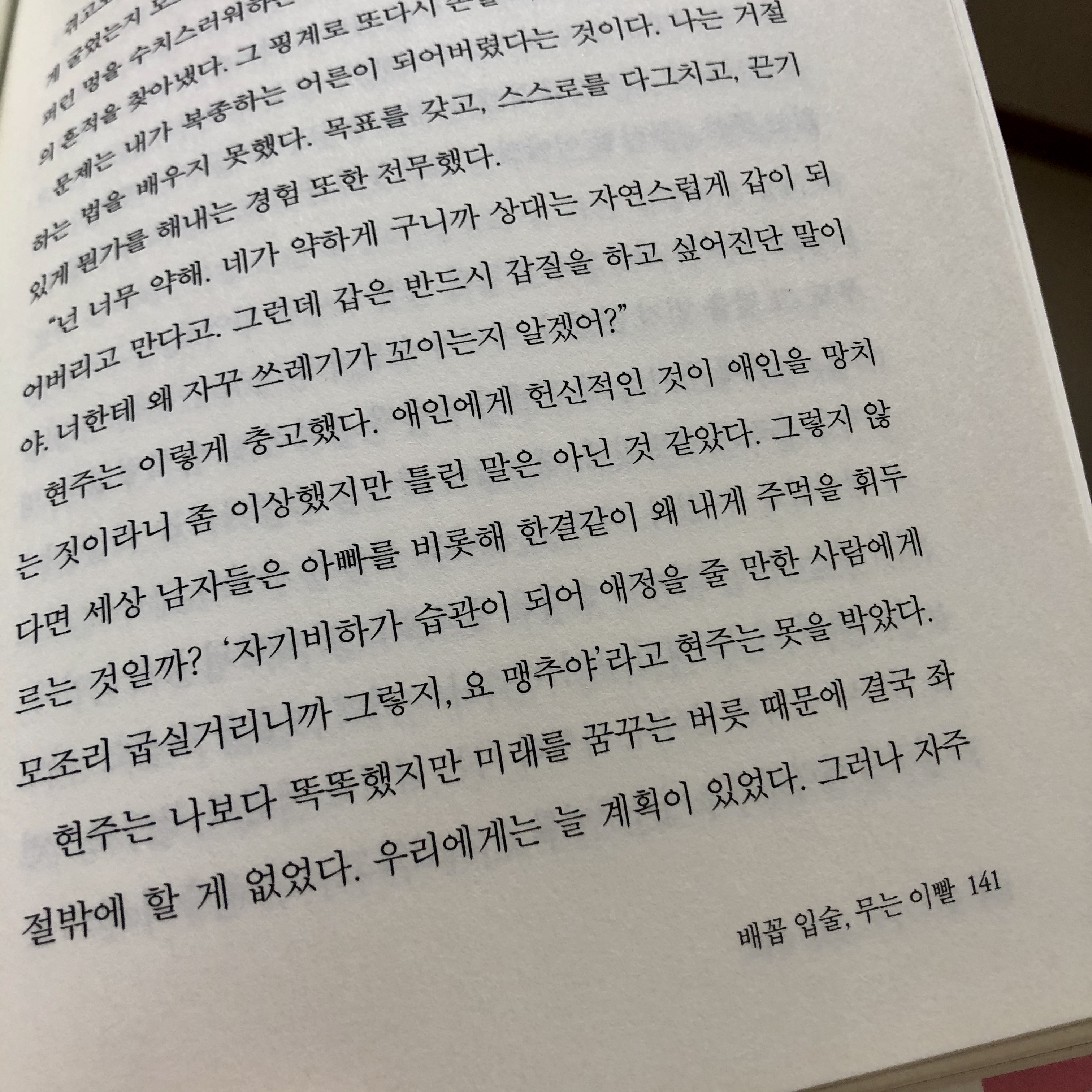
어찌나 그러한지 기괴하기가 마치 만화 영화 같다. 억눌려 있던 것을 터뜨려 주는 것은 단전의 배꼽이었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이빨이었다. 비틀린 것들을 위로하는 허구가 뒤섞인 작품이지만 그 속에서 아프게 꼬집어지는 우리의 현실에 슬픔을 느낀다. 짧게 집약된 작품들의 향연에 감사하다. 지독한 이야기들이 장편 소설이었다면 그만 숨을 쉬기 어려웠을지 모르니 말이다. 가상의 인물들이 말하는 치명적인 스토리의 진행에 숨을 죽이며 끝을 보았다. 어설프게 이들을 위로하기 보다도 오늘의 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짬을 만들게 하는 소설, 「에디 혹은 애슐리」였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곽 - 레이첼 커스크 (0) | 2020.08.31 |
|---|---|
| 베토벤이 아니어도 괜찮아 - 최정동 (0) | 2020.08.25 |
| 빌레뜨 2 - 샬럿 브론테 (0) | 2020.08.17 |
|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 안희연 (0) | 2020.08.08 |
|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1 - 아르놀트 하우저 (0) | 2020.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