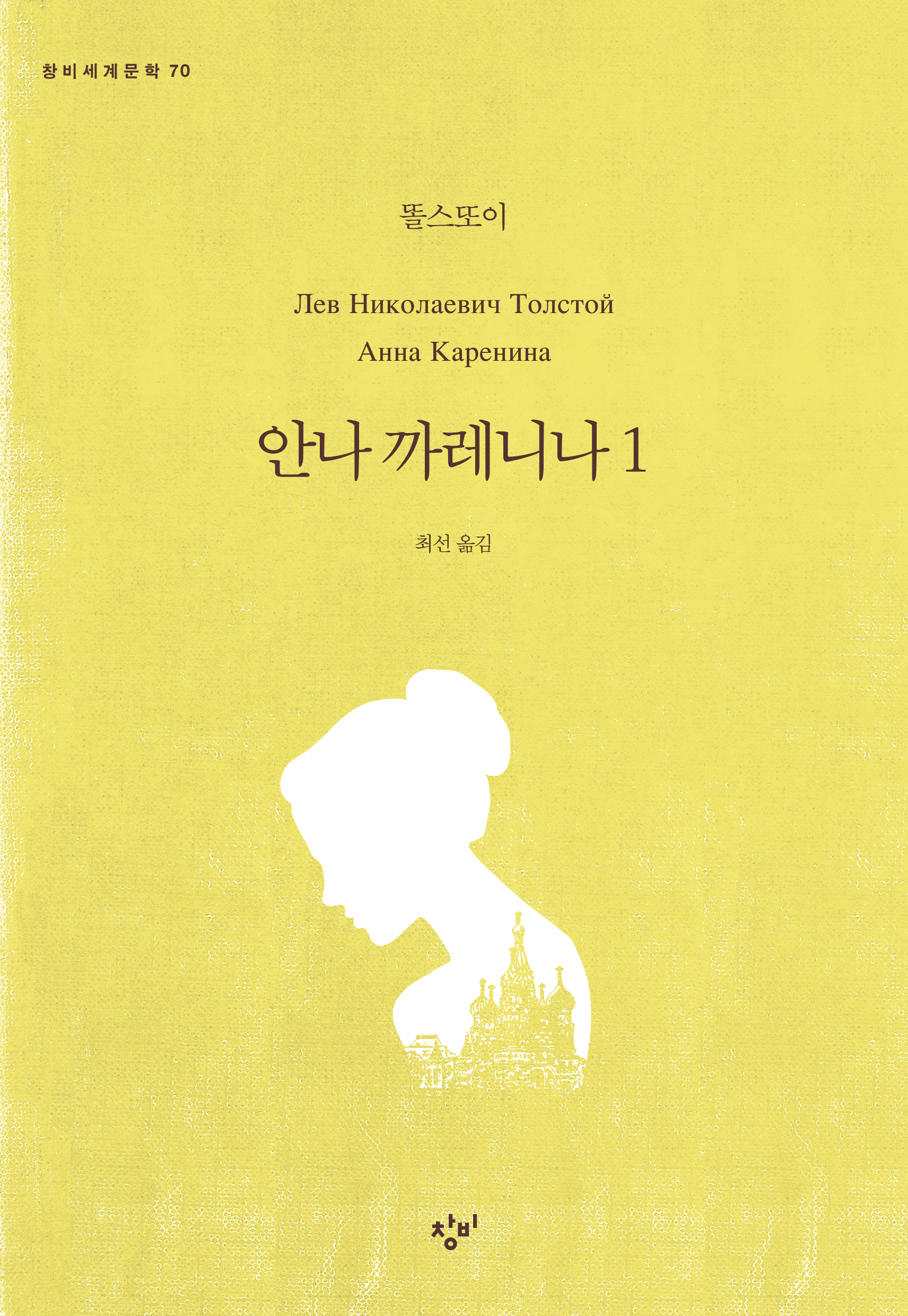
레프 니꼴라예비치 똘스또이 : 안나 까레니나1 (2019). Changbi Publis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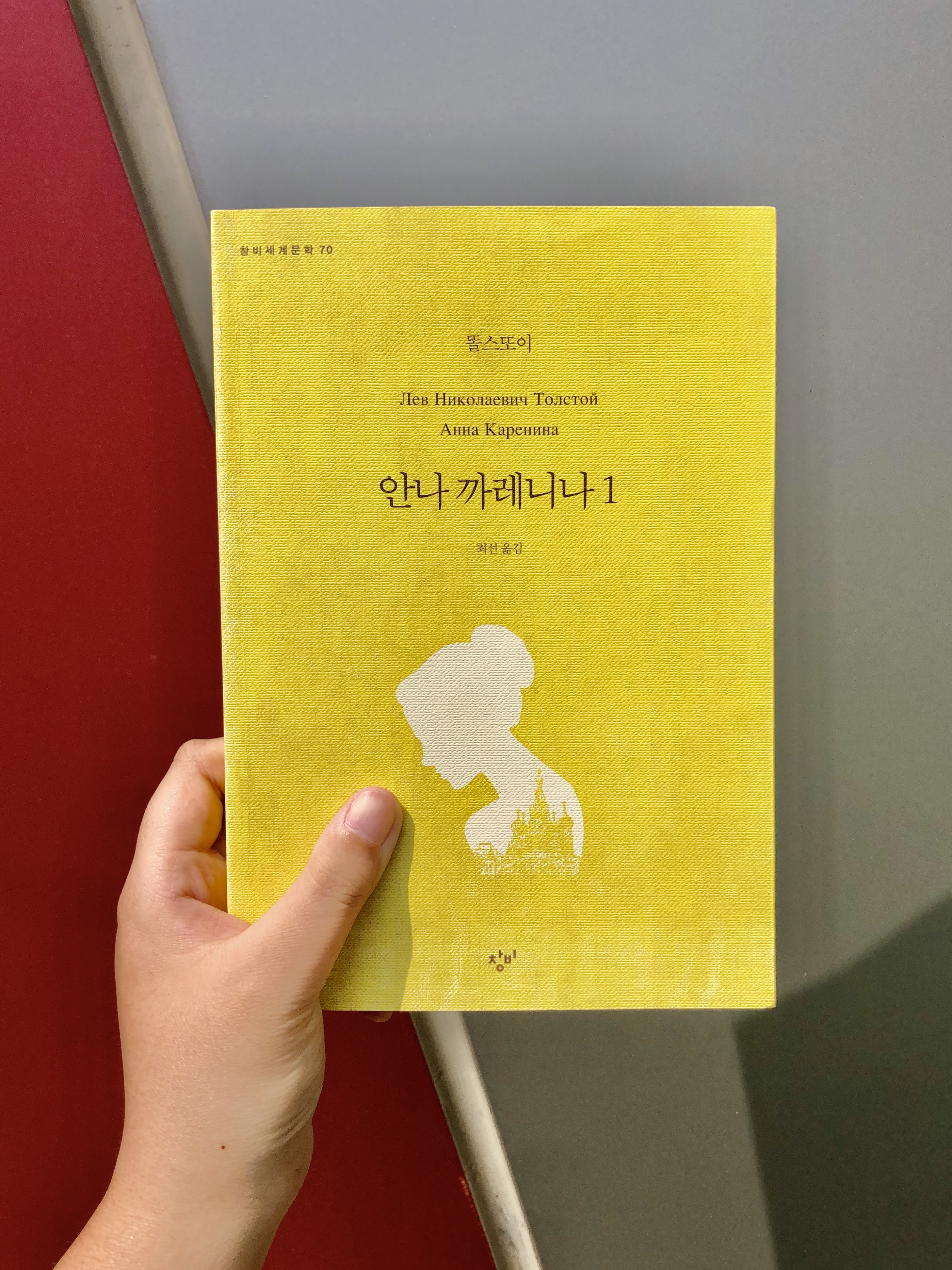
알쓸신잡에서 소설가 김영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작가는 작품에 주제를 숨겨놓지 않는다고 독자들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타인을 잘 이해하게 되면 되는 거라고. 그분은 또 말하셨다. 대화의 희열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 소설을 나와 다른 상황의 인물에게 공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이해하게 된다고. 정말 존경하고 마주하게 된다면 마음 깊이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다.
글쎄 왜 내가 소설을 잘 읽지 않게 되었나하는 이유를 굳이 찾고 싶어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책만 보고 있는 건 또래 아이들에게 지루한 일이었고 나는 그걸 청소년이 되어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책을, 특히나 소설을 멀리했던 것이라 생각하곤 한다. 근데 그게 늘 책만 보던 내가 책을 놓은 그 순간이 어느새 나를 바꿔 가고 있다는 걸 언젠가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빠르고 자극적인 것,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그런 것에만 심취하고 긴 글을 따분하다 넘겨버리는 것은 어느새 연기가 아닌 진심이 되었고 그렇게 멀어져 갔다.
그래서 나는 책에 빠져 있었던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다.
되려 주변의 시선이 온 세상의 전부인줄 알아 책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을 후회한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 아니 소설을 잊은 그대에게. 또 무료히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죽이는 일상에서 김영하 선생님의 저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같은 일상을 살지 않았을까 싶다. 전혀 접점이 생기지 않는 소설 속 주인공과 내가 책을 통해 연결되었던 순간들, 머릿속에 펼쳐지던 그림들. 지금은 도무지 쉽지 않은 그 상상들이 너무도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다시금 내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됐다. 생각해볼거리들이 많은 비문학 교양서를 읽고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럴싸한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무언가를 쥐어짤 필요도 없었다. 그냥 방에 혼자 앉아서 너무도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러시아 귀족들의 옷감을 느끼고 음식의 냄새를 맡고 파티에 서면 될 일이었다.
그래, 작가의 입장에서 말하는 '작가는 책에 주제를 숨겨놓지 않는다'하는 말이 내게 위안과 용기를 줬다. 고전 명작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겐 중압감이 생겼었다. 이는 꼭 책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이하게도 어린 시절의, 정말 어린 시절의 이를테면 초등학생이었을 무렵 나는 사람들과 함께 왈가왈부하며 토론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 나는 그 열렬한 투쟁을 위해서 굳이 다수의 사람들과는 반대의 측면에 서서 나의 생각을 실컷 떠들어대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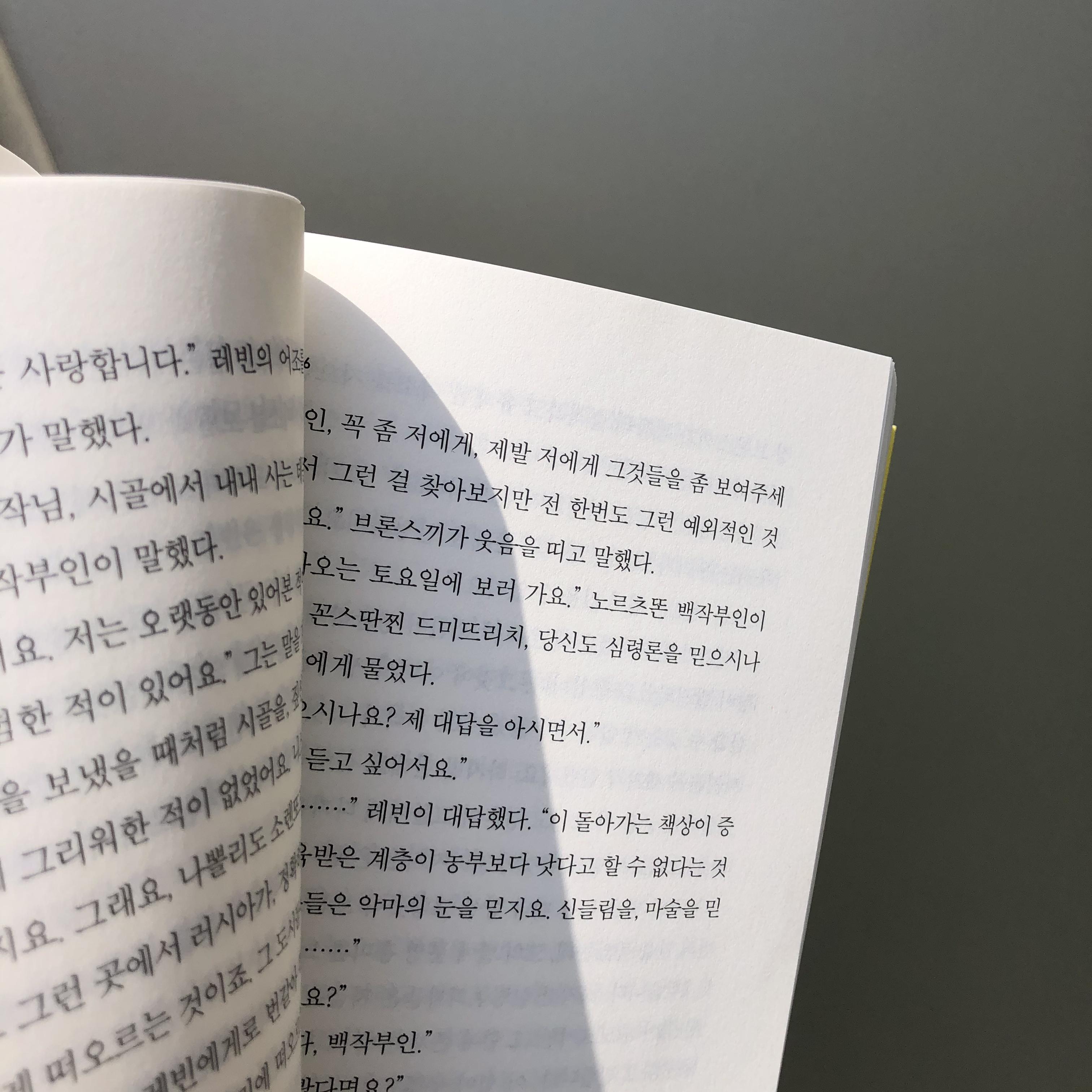
그런데 그것이 꼭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겨먹는 대화에서 이해하는 대화를 즐겨하게 된 이후로 나는 다수에 끼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눈에 띄거나 이상해보이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것을 나도 그렇게 느끼려 노력했다. 답 찾기를 위한 방법을 깨치고 훈련을 계속하면서 나는 족집게 강사처럼 문학을 낱낱이 헤집어놓을 수 있게 됐다. 왜 그렇게 되냐고 묻는 친구들에겐 친절히 그 포인트들을 잡아서 캐치하는 방법을 널리 전파시켜주곤 했다. 어리석었다. 실은 아무것도 도움될 것 이 없는 쓸모없는 기술에 목을 메어 나는 그렇게 문학을 잃었던 것이다.
점수는 오르고 만족스러운 지경이 되었지만 그것이 가져간 대가는 혹독했다. '답'이 없는 대학에 와서 책을 읽은 감상을 묻는 교수님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더듬거리며 겨우 내뱉은 대답은 스스로도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건 결코 나의 감상, 느낌이 아니었다. 그냥 모두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뻔한 소리를 지껄였을 뿐이다.

이제나마 다시 내 마음 내 시선을 되찾고자 다시 억지를 쓰며 읽었다. 애초에 내가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고스러운 시간들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더는 내 젊은 나날을 무감하게 보낼 수 없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책을 들었다. 안나 까레니나 속 삶과 내 삶은 다르다 못해 죽어서 다시 태어난대도 결코 이럴 수 없을 것 같이 너무 큰 벽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갑갑하고 옭아매인 러시아 귀족층의 일상에 내가 빠져들었기에 나는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가슴이 아팠다.
오로지 사랑만 부르짖는 소설, 노래, 작품들을 보고 이전의 나는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무지한 것의 표상이라며 지겹게 쳐다봤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들을 그저 옆에서 바라보고 그토록 마음아프게 한 일을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싶다. 도덕과 사회 비판 같은 머리 아픈 것들은 제쳐두고 그냥 온전히 슬프고 싶어서 책을 계속하여 읽는다. 거절의 슬픔과 만남의 환희가 주는 생경한 감정을 덩달아 느끼고 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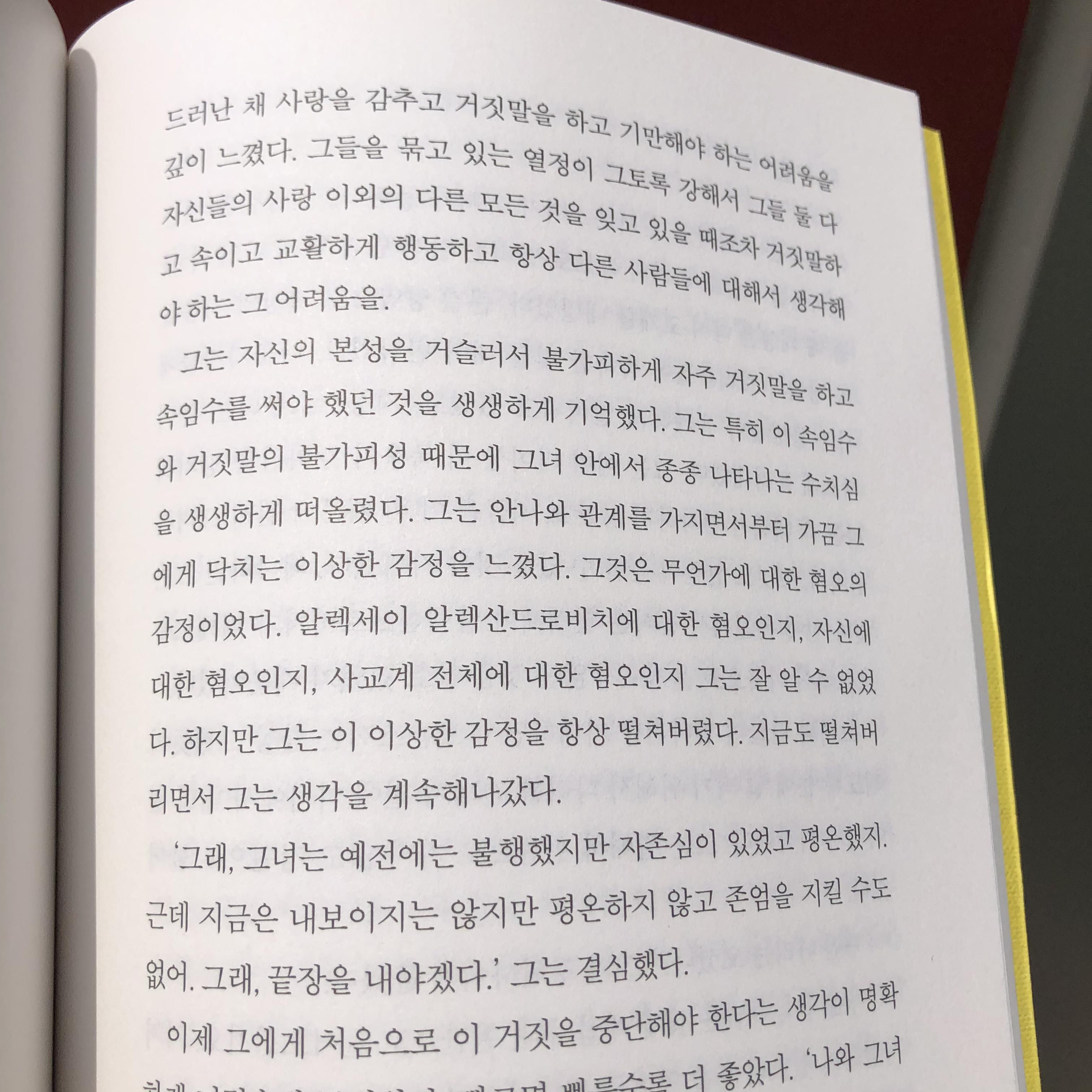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언급하기에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저 짧은 몇 분의 말을 전해듣지 않았다면 뭐가 아쉬운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과거를 아쉬워하고 시간을 흘려보냈을 테니까. 거창하게 책 읽기를 시작할 마음은 들지 않고 그래도 도대체 무슨 얘길 한 건지 궁금하다면 한 번 김영하 소설가의 말을 들어보셨으면 한다. 굳어있는 소설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아니 그 시작이 아예 없다 하여도 우릴 거세게 뒤흔들어 소설을 사랑하게 만들어줄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조언이니 말이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빌레뜨 1 - 샬럿 브론테 (0) | 2020.07.06 |
|---|---|
| 한길사 대학생 서포터즈 3기 합격과 웰컴박스 (0) | 2020.07.02 |
| 선량한 차별주의자 - 김지혜 (0) | 2020.05.10 |
| 초년의 맛 (0) | 2020.05.03 |
|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0) | 2020.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