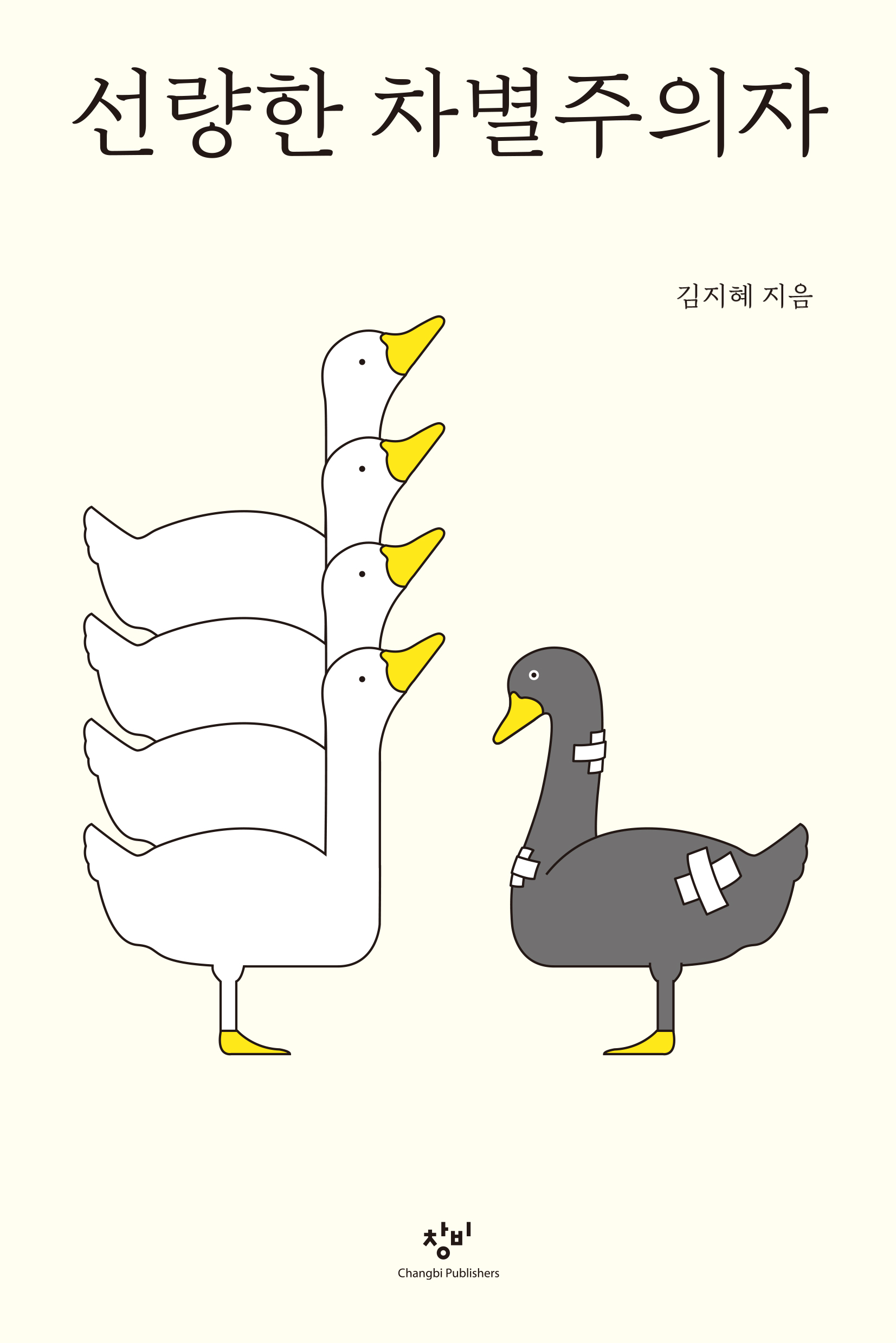
김지혜 : 선량한 차별주의자 (2019). Changbi Publishers

'결정장애' 저자를 일깨워준 한마디. 꼭 그런 말이 내게도 있다. '충(蟲)'이다.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언젠가 그 무렵부터 이 말은 유행이 됐다. 다수의 사람에게 소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충이 따라붙었다. 진지하기 그지없으면 진지충, 설명을 길게 하면 설명충, 자기 아이만 위하면 맘충... 나는 이 '충'자가 불쾌해 치가 떨린다. 마음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또 차별이 아니냐고 할 텐가 그냥 이건 혐오 발언 딱 그뿐이다.
처음 이 말을 듣자 단순한 의문이 생겼다. '충은 벌레가 아닌가?' 사람한테 왜 벌레라 하지? 생물학 수업을 들으며 벌레의 가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듣곤 했다. 교수님들께서는 벌레가 꼭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싫은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으신 듯 보였다. 그래서 충을 붙이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존중하는 마음에 그걸 붙이는 걸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재밌어서? 전혀. 벌레 하면 떠오르는 사회 통념에 따라 혐오를 가져다 붙여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잔인한 이 행위는 너무도 쉽게 퍼져나갔다. 나도 그 일원이었다. 깔깔대며 웃는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어서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아이가 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쉽게 내뱉었다. 처음은 너무 두근거리고 떨렸다. 불쾌한 느낌이었다.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지만 그 누구도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나는 안심했고, 이 단어를 내뱉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이 되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작은 사회라고 일컫는 학교를 지칭하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나는 학창 시절 지금보다 훨씬 더한 겁쟁이였다. 작은 무리에서 도드라지기는 쉽고 배척되는 것은 더더욱 쉽다. 그냥 평탄한 무리에 들기 위해서 죄책감을 던졌다고 자기 위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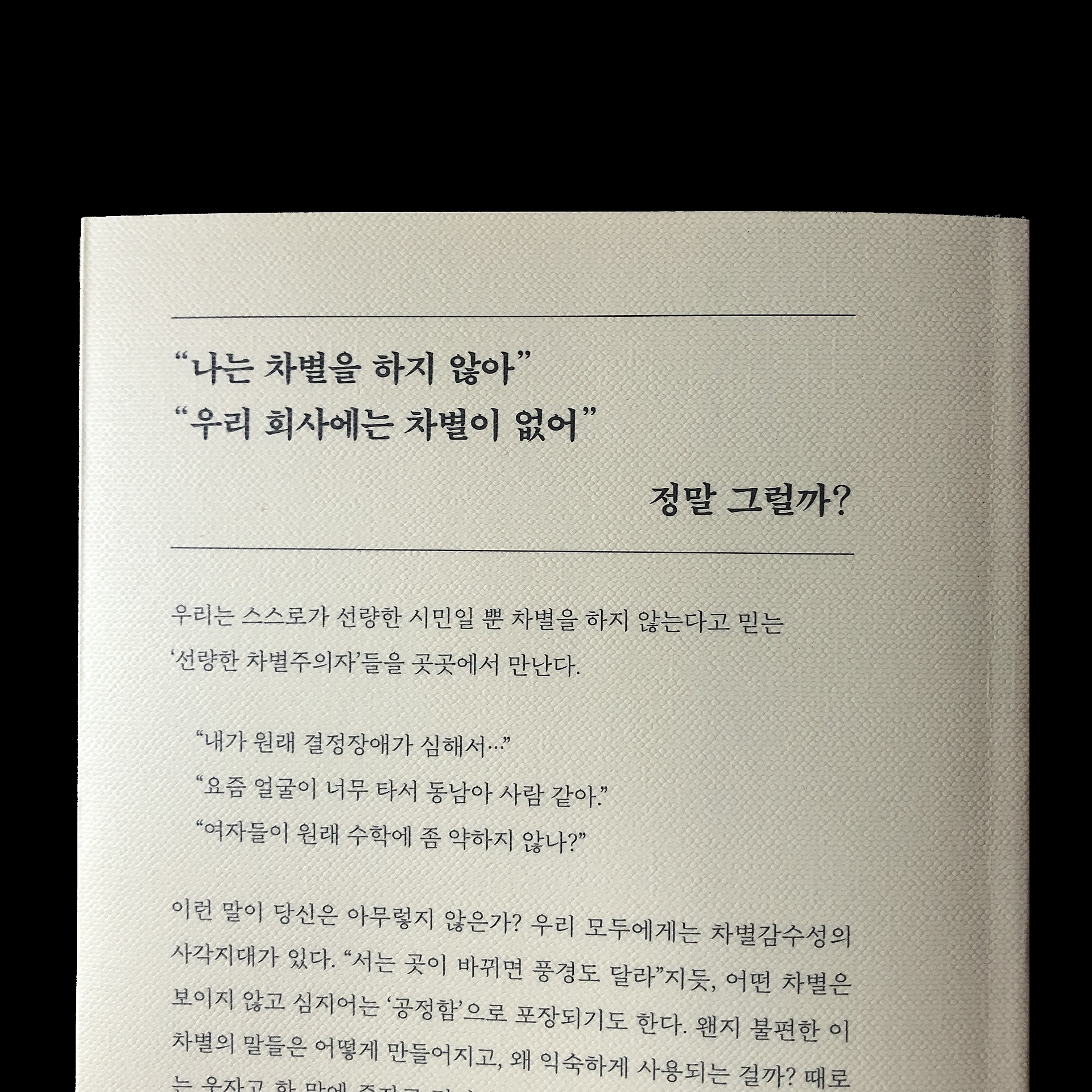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유는 불편한건 불편하다고 내 마음껏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와서라도 이렇게 뉘우친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간다 해도 나는 여전히 용기 있는 아이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에 이렇게 글을 쓴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단어, 꼭 써야겠느냐고. 잘못을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자란 우리에게 혐오표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갔다. 누군가 만든 새로운 단어들은 쉽게 퍼져나갔고 재미있는 말로 소비됐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그 대상엔 별 관심이 없었다. 그건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고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걸 언급하는 데 자처한 이들은 '불편러'가 됐다.
이상하게 멋지다, 좋다, 잘한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칭찬할 그 한마디 하는 건 남사스러운 일이 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은 너무 쉽게 나갔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말이 지금 무엇보다 고파졌다. 쉽게 칭찬을 하면 그건 또 가식이 됐다. 복잡함에 그냥 말을 잃게 됐다. 사랑과 관용은 동화 속에서나 있는 것이었나. 종교적 의미를 제외하지 않고 일상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런 상상 속 말들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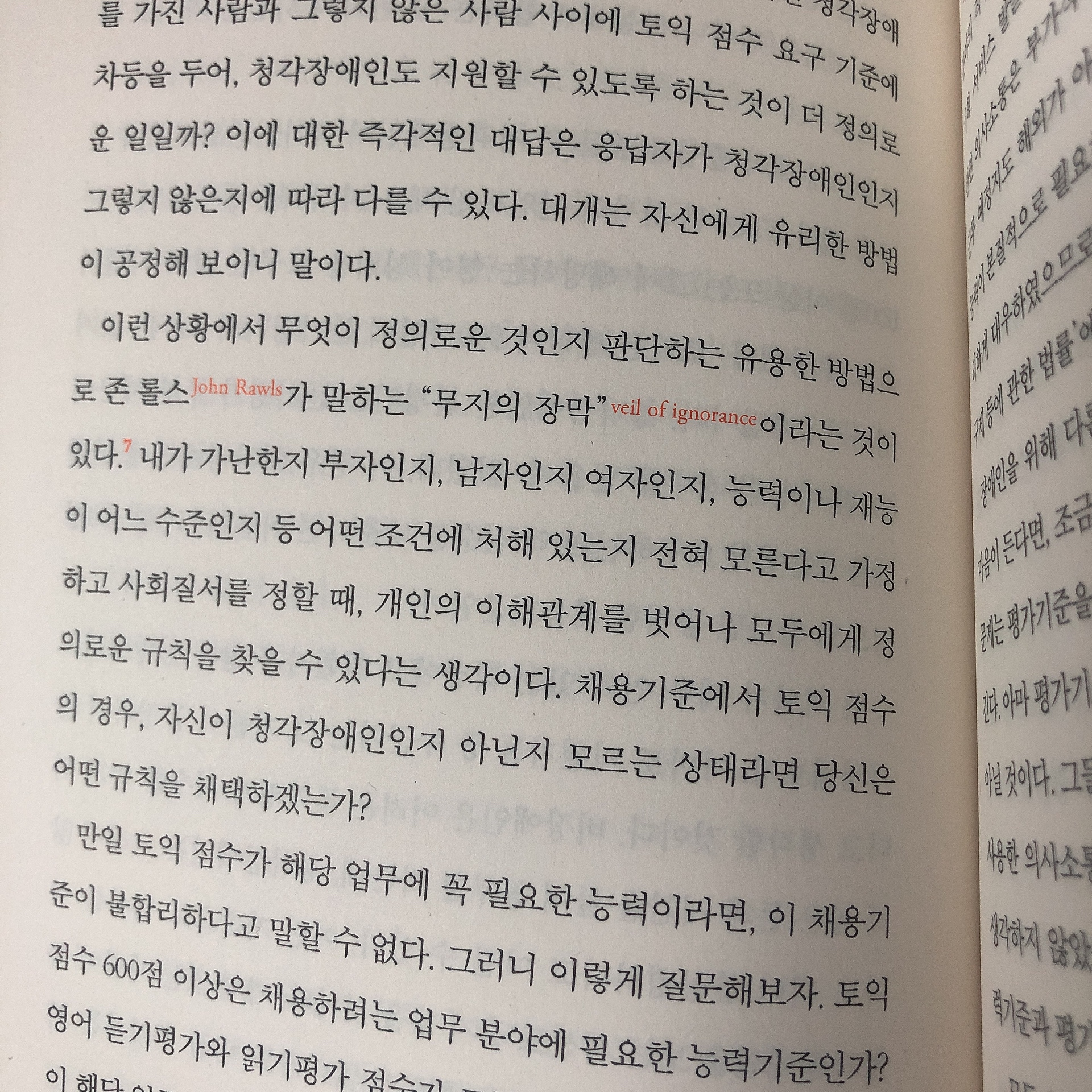
남을 깎아내리는 혐오를 해서 쌓이는 일말의 가책이 싫은 것일까. 혐오표현을 쓰는 이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사는 이들을 에둘러 표현한 것뿐이라 한다. 그럴만하니까 그랬다는 거다. 말문이 막히는 이 사유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이것은 자신들만의 철학이자 정의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말이 나올 이유도 없었다는 뭐 그런. 누가 씌워주지도 않은 정의의 사도를, 정의를 내세우며 비난하고 경멸하고 까내린다.
쉽게 등장하는 말이 또 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안 그래도 피곤한 일 많은 일상에 우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주기엔 너무 지쳤나 보다. 누가 뒤에서 욕하고 누가 돌을 맞든 얼굴 맞댄 지금은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들. 진지한 것에 시간을 쏟을 에너지가 없는 우린 이렇게 늘 문제는 덮고 외면하고 싶어 한다. 주변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흐름에 타있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하호호 내가 아닌 일을 흘려보내는 일상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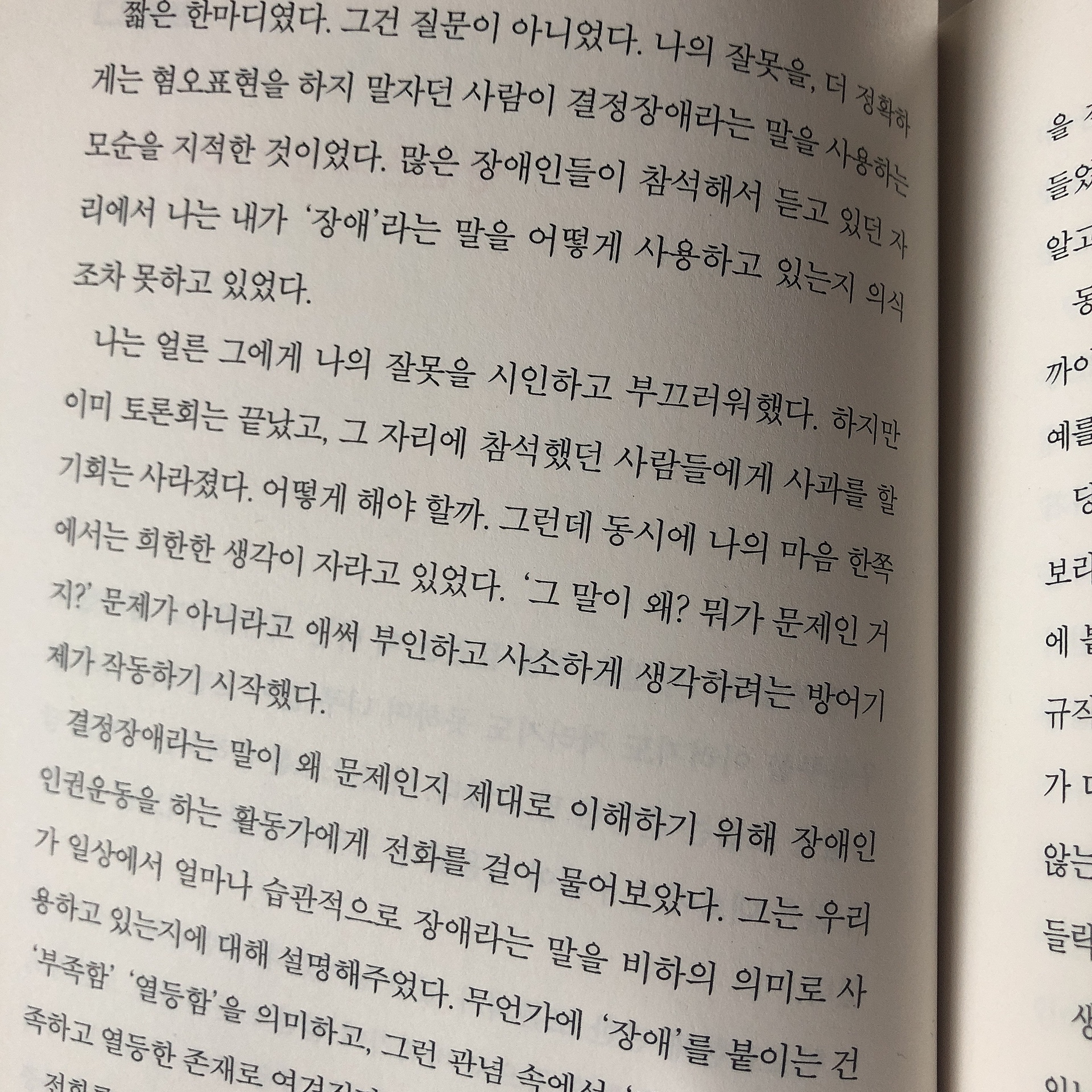
예민하고 민감해서 지치는 일을 관둘 수 없는 성격 탓에 나는 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된다. 안 좋은 행위다 고쳐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수없이 되뇌어도 다시 혐오의 대상으로 떠밀어 버리고 귀를 막은 모습에 벽에 소리치는 듯한 답답함을 무한히 느껴야겠지만. 싫은 걸 싫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걸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좋게, 같이 잘 살게 바꿔보자는 의도가 퇴색되어버린 무차별한 던짐에 고통받아 죽어나가는 게 과연 바라던 바였는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혐오표현까지 오게 된 배경이 자꾸 신경 쓰인다. 혹자는 말한다. 좋게 좋게 해보려 했지만 대화가 안되고 고쳐지는 것 없이 들어먹질 않는 모습에 욱하여 이 말 안 하곤 못 배기겠다고. 누군가 괴로워하는 일을 보며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고치라고 일갈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쉽게 공감하는 사람이라, 감성적이라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다. 그냥 인간이니까. 다 똑같은, 아무것도 없이 세워놔 보면 다 그만한 인간이니까 공격이 아파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다. 어쭙잖은 변명이 더 후벼 파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완벽히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될 수도 없고 착한 척만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눈감고 던진 혐오에 누군가 아파하지 않게 영원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 각오로 매일을 새기고 있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길사 대학생 서포터즈 3기 합격과 웰컴박스 (0) | 2020.07.02 |
|---|---|
| 안나 까레니나 - 레프 니꼴라예비치 똘스또이 (0) | 2020.05.18 |
| 초년의 맛 (0) | 2020.05.03 |
|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0) | 2020.04.26 |
| 햄릿 - 윌리엄 셰익스피어 (0) | 2020.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