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노리스 씨 기차를 갈아타다(2015). Changbi Publishers
창비에서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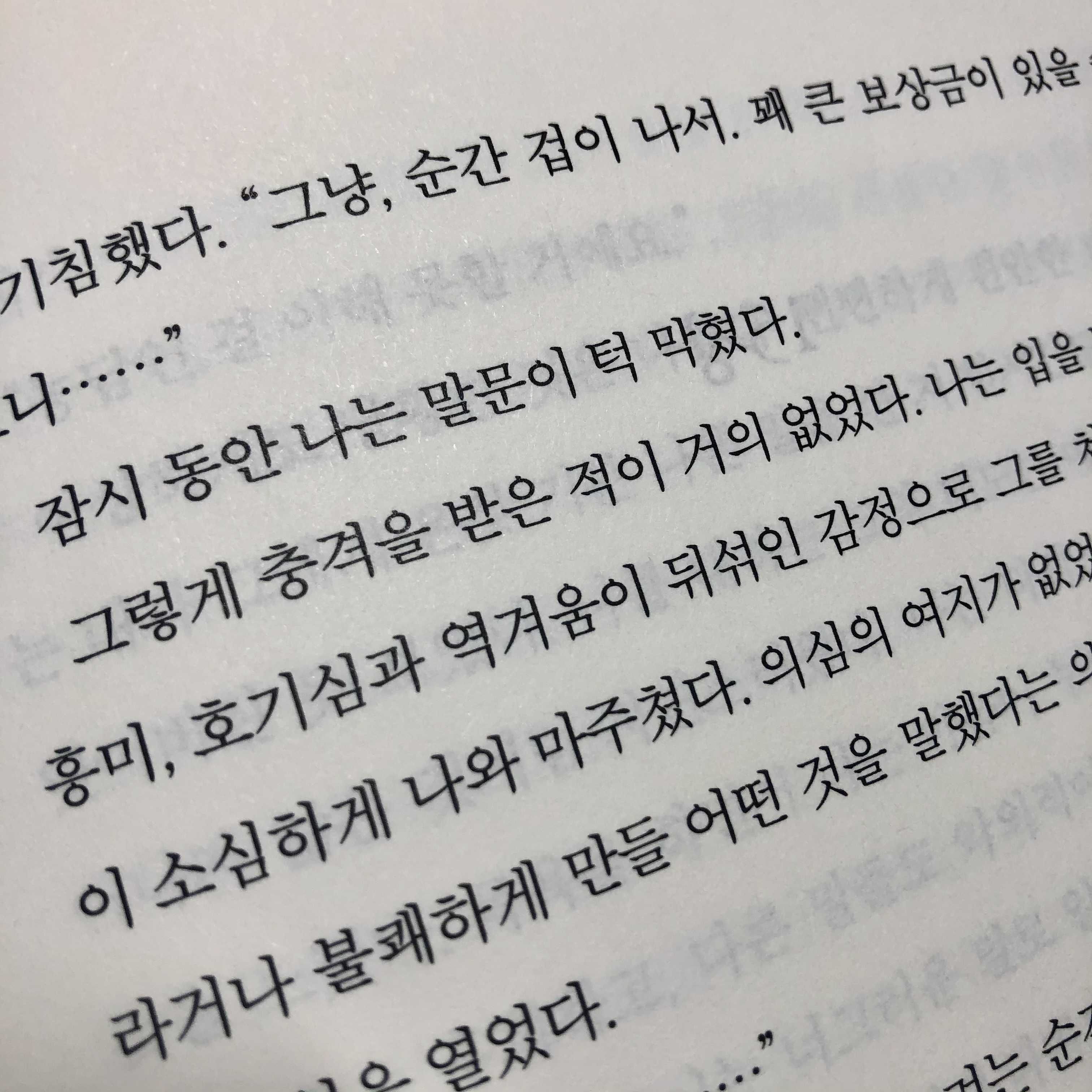
특별히 어떤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책을 읽는 것에 어떤 목적을 가진 입장의 기준에서는 말이다. 한 해동안 창비의 많은 책들을 읽어왔고 그 모두 나의 선택으로 받은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고전 명작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별다른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 거쳐온 시간 중 만난 한 사람 덕분에 생긴 목표였다. 지금으로부터 정말 머나먼 옛날의 일이다. 기억도 잘 안나는 초등학교 5~6학년 때쯤. 내가 다니던 학교의 음악 선생님은 조금 독특한 분이셨다. 그분이 입고 오시는 옷은 잘 차려져 있었지만 어딘지 오래된 고풍스러움을 느끼게 했고, 그분이 쓰고 오시는 빨간 안경은 더욱더 그런 느낌을 들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사춘기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어딘가 틀어진 나에게는 선생님의 고상한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쏙 들었다. 나긋한 말투도 그랬고, 지긋하게 꿰뚫어 보는 눈빛도 그랬다. 그런 선생님의 한 마디는 책에 대한 어떤 마음을 차오르게 하기에 충분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한다는 그런 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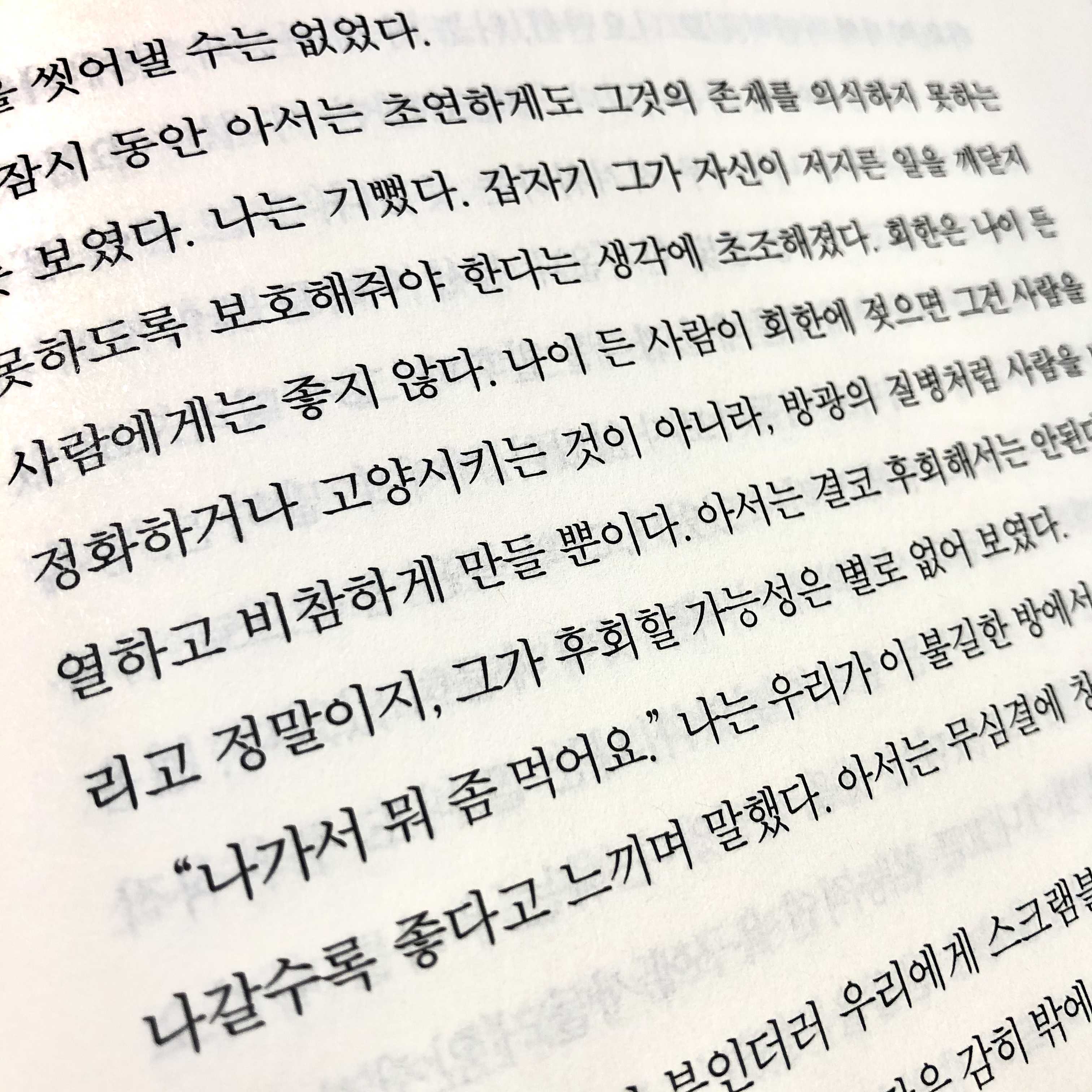
내겐 그런 선생님의 말과 모습이 크게도 와 닿았던 것 같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그 이후의 어떤 다짐이 머릿속에 생생한 걸 보니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졸업과 함께 나는 책과는 저 머나먼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다시 이들과 가까워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시작에서 나는 한 가지 다짐을 했더랬다. 고전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 되자고.
중˙고등학교를 지나며 내겐 쓸모없는 이과로서의 틀에 박힌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설과 같은 비논리적인 글을 읽기보다는 실용적인 자료를 읽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그런 생각이었다. 지금에 와서야 얼마나 어리고 무식한 태도였는지를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다짐이 하나 도움될 것 없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된 이후로 어찌나 후회를 했었는지. 나는 이제야 소설의 필요성과 소설을 읽는 이유를 조금씩 깨닫고 있으며, 그 효용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부족을 채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책에, 특히나 고전에 집착을 했었고, 그렇게 2020년이 흘렀다. 서론이 길었다. 오늘, 2021년 1월 4일 새로운 해를 함께한 첫 소설의 리뷰를 한다는 것에 괜히 장황한 말을 덧붙이게 되었다. 어쨌거나 결국 이렇게 지난 한 해를 함께한 창비 책과 더불어 올해 역시 창비의 책으로 시작을 함께하게 되었다. 내겐 책을 읽는다는 것이 주는 감회가 달랐던 지난해가 갔고 유명 명작소설에만 머물던 시선을 조금 확장한 새해 첫 도전의 결과물을 말하고자 글이 늘어졌다.
앞선 이야기들에서 풀었듯 나는 최대한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내게 '도움'이 될 책들을 찾고자 했고 그중에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작가는 내게 낯선 축에 속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 「노리스 씨 기차를 갈아타다」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했다.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영문 소설이라는 문구도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저자 서문은 더욱 불안을 가중시켰다.(저자 서문은 꼭 책을 다 읽은 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이전에 읽은 「더블린 사람들」에서 밋밋한 실패감을 맛봤기 때문에 책을 처음 펼치는 순간에 전혀 기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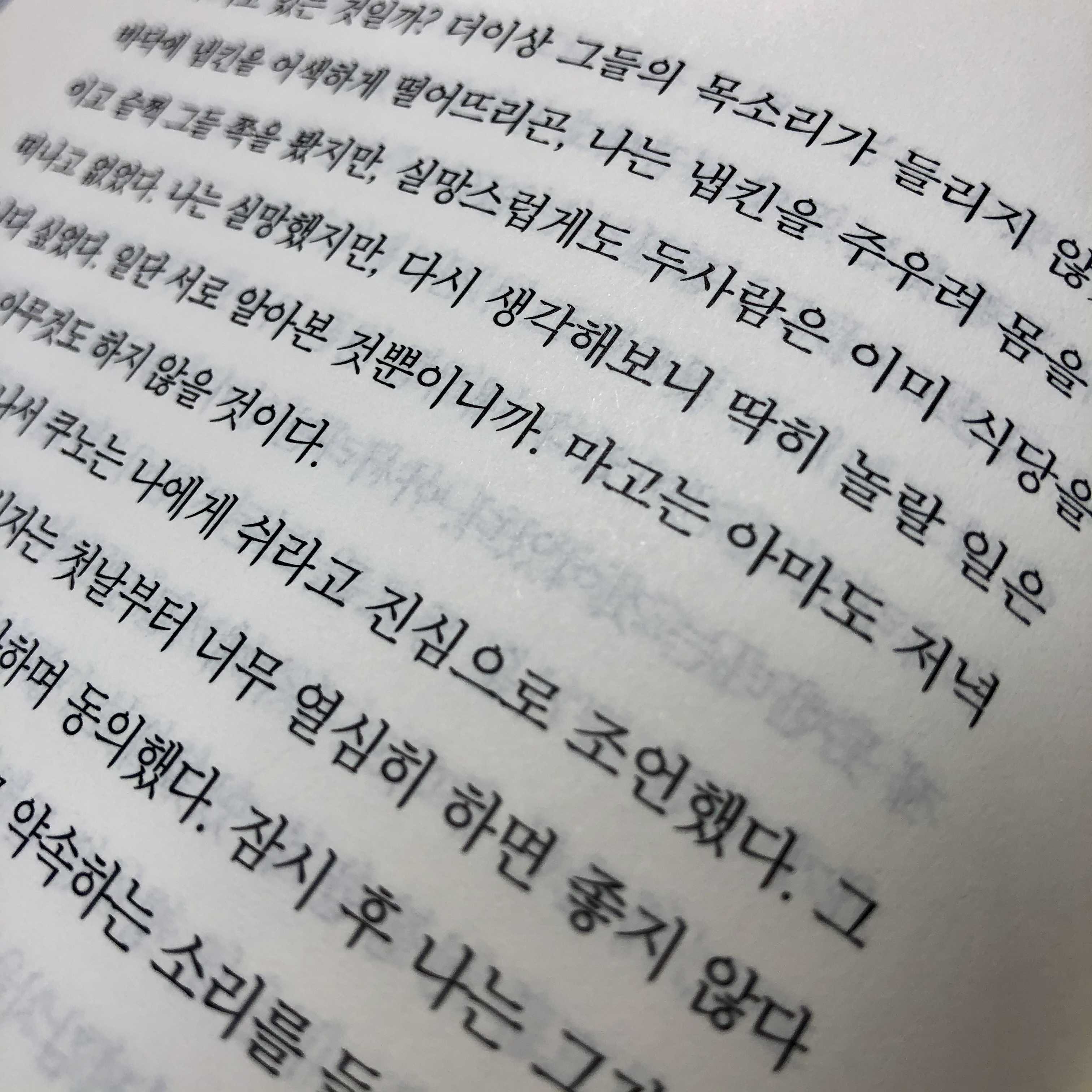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었을까.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이 책을 고른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고 오히려 정말 다행이었다는 안도를 느낀다. 낯선 작가 크리스토퍼 이셔우드가 풀어내는 베를린 이야기에 어느새 빠져들어 책의 말미를 붙잡고 싶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사교적인 성향에 모든 것을 내면을 알아챌 것만 같은 윌리엄이지만 사실 독자들은 그가 모든 것에 통달해있지 않음을, 조금씩 드러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통해 알게 된다. 흔들리는 정권과 일상을 붙잡은 혼돈과 폭압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보는 과정은 한 편의 추리 소설을 읽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기차에서 만난 노리스 씨와 브래드쇼는 기차역에서 헤어졌다. 노리스 씨의 농담은 사람들을 웃기지 못했지만, 노리스 씨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었다. 잠시간 이들과 함께 베를린에 있었던 우리 역시 사실 노리스 씨에게 의지해왔음을 빈자리를 통해 깨닫는다.
이셔우드는 어떤 젊은 외국인이 혼란스러운 당시의 베를린과 사랑에 빠졌기를, 그래서 이들 모두의 이후를 그려내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그에게 있어 당신의 책을 읽은 어떤 젊은 외국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후를 그려내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을 느낀다. 함부로 걱정을 가졌던 이전의 모습에 사과하며, 흡입력 있는 작품으로 기분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를 보낸다. 언젠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새어나간 상상력이 다시 찾아오는 어느 날에, 세계를 떠돌고 있을 노리스 씨를 그려볼 수 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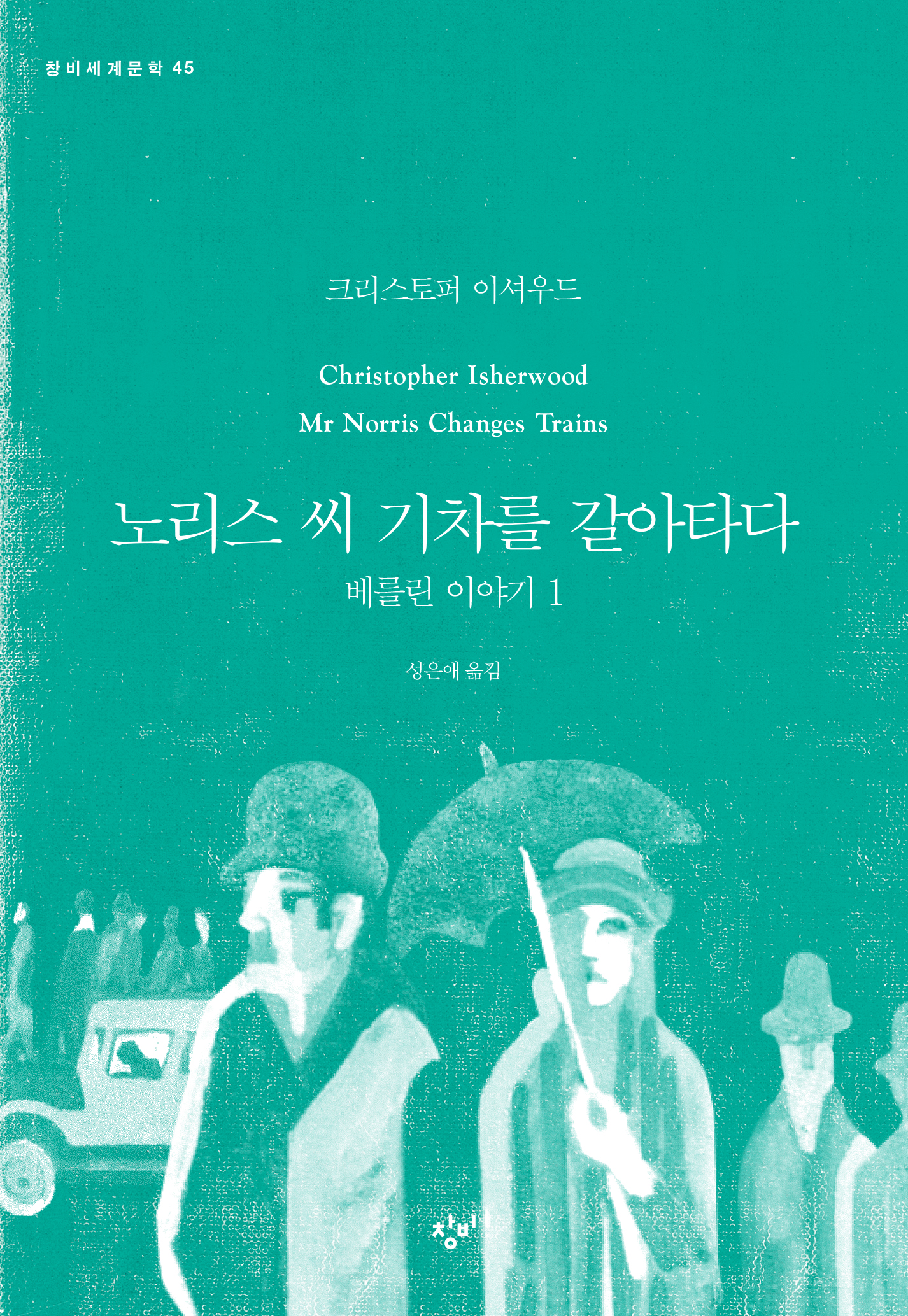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이비 팜 - 조앤 라모스 (0) | 2021.02.28 |
|---|---|
| 베를린이여 안녕 -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0) | 2021.01.19 |
| 더블린 사람들 - 제임스 조이스 (0) | 2020.12.28 |
|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김소월,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0) | 2020.12.21 |
| 개의 심장 - 미하일 불가꼬프 (1) | 2020.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