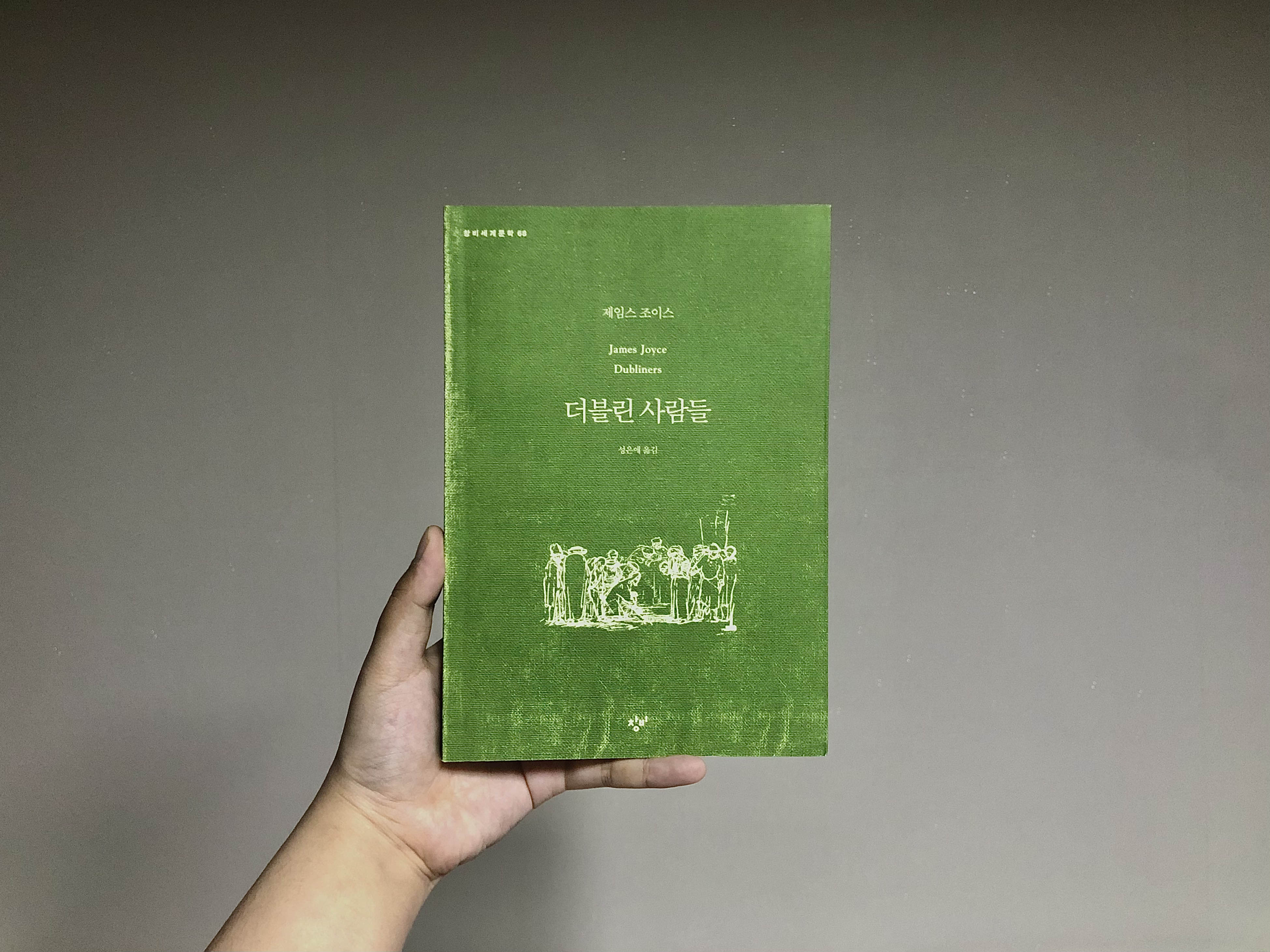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2019). Changbi Publishers
창비에서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코로나에 일상을 점령당한 이후로 감정을 소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 중 일부에 속했다. 지금의 내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어딜 가든 모두가 공유하는 우울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 블루.
일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지만 푸른색이 우울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푸른색의 한기가 그렇게 암울하게 느껴지곤 했다.
그리고 「더블린 사람들」에게도, 블루가 도사린 것 같았다.
어디에서든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더블린 사람들로 묶여있다. 조금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임은 변함이 없다.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먹고 마시고 놀며 사는 이야기들. 누군가는 도피를 꿈꾸고 누군가는 고향을 찾아 향수를 씻어낸다. 가볍고 무거운 주머니의 반증은 우리들의 삶과도 멀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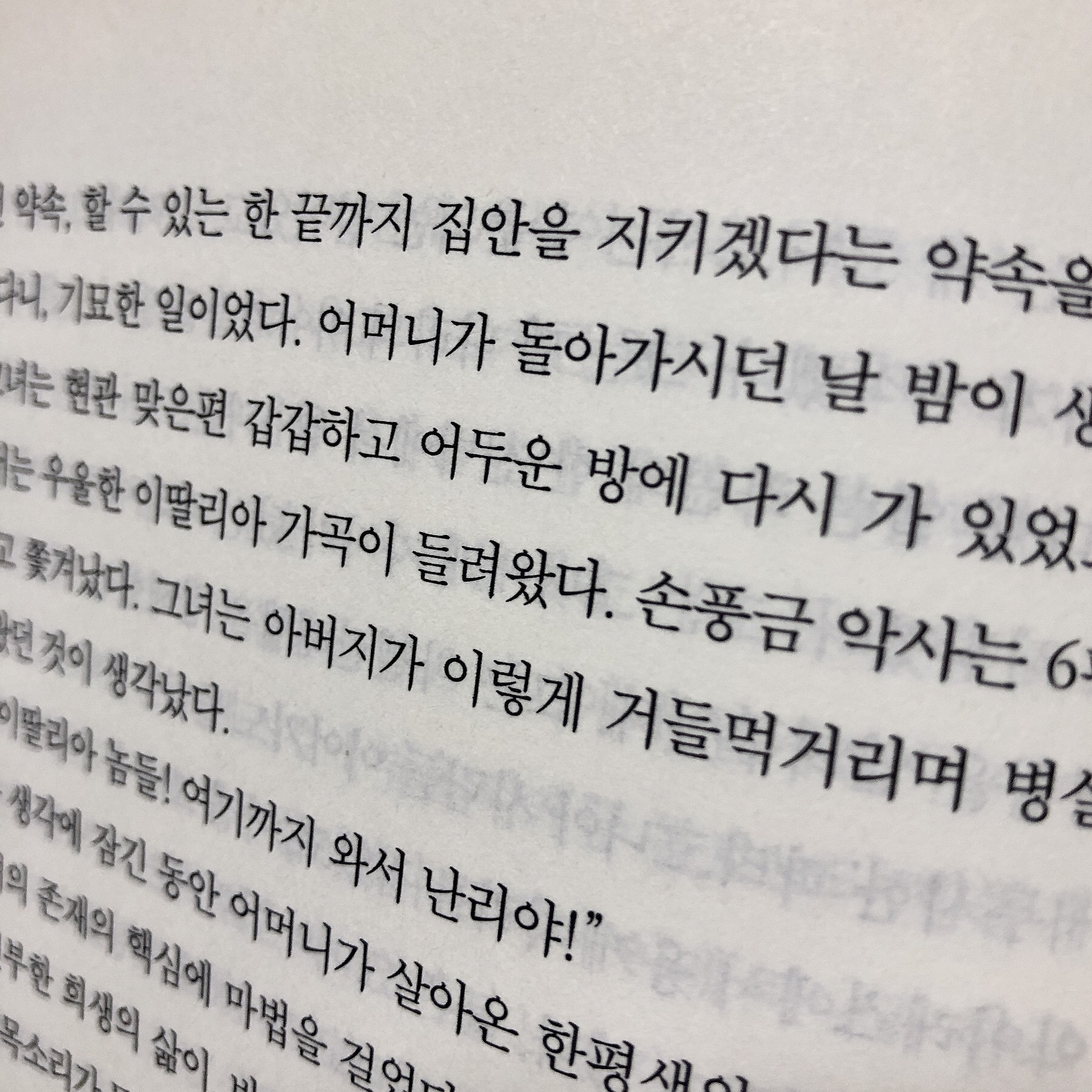
그런데 그 삶이 우울하게 느껴진 것은 왜일까. 술에 진득하게 취한 이들이 등장할수록 눈물과 자조를 보이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더블린 사람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의 우울과 나의 것이 가진 동질성을 알아챔으로써, 지금의 우리의 생활 역시 순탄하지 않음을 역으로 깨닫는다.
제임스 조이스는 세필 붓을 든 화가처럼 빼곡하게 소설을 채워나갔다. 내면과 외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덕분에 독자는 치우쳐지지 않은 다량의 정보를 전달받는다.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소설은 '더블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다시 '더블린 사람들 보고서'에 걸맞은 형태로 다가온다. 보고서라는 말이 가장 걸맞다고 생각한 것만큼 세세한 모습 그 자체를 작가와 함께 관찰하게 된다. 늦은 밤 침대 위에 누워 생각에 잠기는 모습까지 훔쳐보는 것 같은 긴밀한 느낌을 공유하면서.
그럼에도 쪼개어진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의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블린의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일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제임스 조이스만이 가진 것 같다. 어딘지 부유하고 있는 모호한 더블린의 일상 속에 나는 그들과 함께 마시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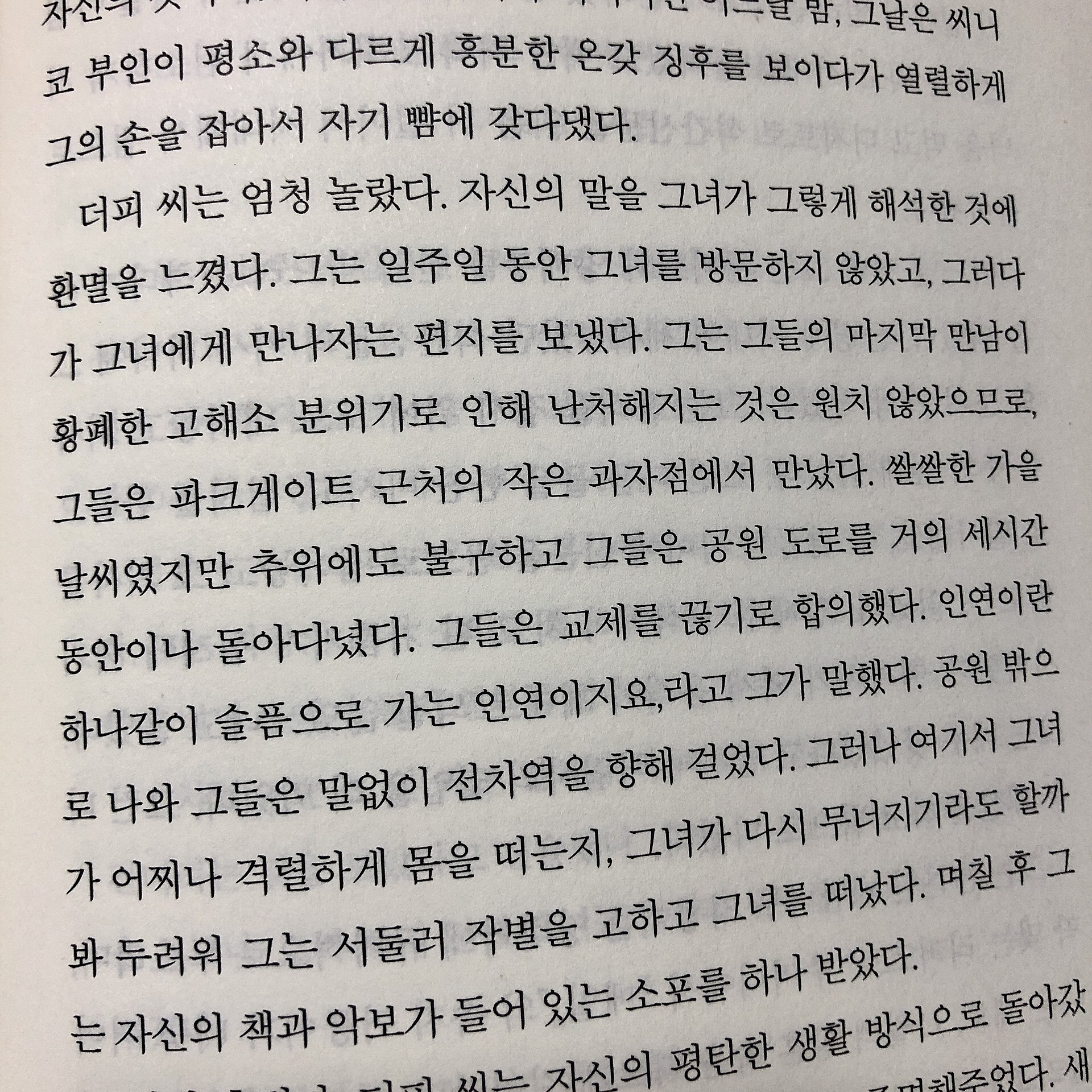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지 않게 그려내는 필력에 감동하게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다인 듯하다. 아마 그 이유는 아직 내게 이를 깊숙이 끌어들일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삶이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위안이 되지 못했고 어쩌면 조금 더 차디찬 감정을 느끼게 했을 뿐이다. 슬픔과 우울의 감정에 동조하기 힘들 만큼 모두가 소모되고 있는 현실이 더욱 소설 같게 느껴지는 시점이다.
언젠가의 새벽에 멈추어지지 않는 거대한 파도에 잠식되고 싶은 순간 다시 읽으면 좋을 소설이다. 평범한 나의 일상의 일부에 찾아온 좌절을 마주했을 때.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질 때. 다시 찾아볼 생각이다. 침전된 일상이 모두의 것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위로가 되는 글에 손이 가는 것 같다. 이를테면 편하게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상상병 환자」 같은.
아일랜드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을까. 세계가 잠식된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될 어느 날, 푸른빛이 아닌 황금빛이 내비쳐질 더블린의 모습을 기대하고 싶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를린이여 안녕 -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0) | 2021.01.19 |
|---|---|
| 노리스 씨 기차를 갈아타다 - 크리스토퍼 이셔우드 (0) | 2021.01.04 |
|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김소월,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0) | 2020.12.21 |
| 개의 심장 - 미하일 불가꼬프 (1) | 2020.12.14 |
|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 정미진 (0) | 2020.12.07 |




댓글